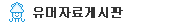일교차가 커 낮에는 아침에 챙겨입고갔던 잠바를 벗어야만 했던 오후였다.
밥하기도 귀찮고, 냉장고에는 콩나물이 곤죽이 되어가는데도 반찬조차 만들기 귀찮았다.
나는 그래서 바람이 되었고.
아니!아니!
편의점이란 참 좋다. 싼 값에 엄청난 칼로리를 섭취할 수도 있거니와 몇몇 품목은 마트보다 싸다.
그리고 제일 좋은점은 우리집 반경 20미터 안에 편의점이 두 개나 있다는 것이다.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기업들의 제품을 불매하는 건 둘 째치더라도 내 배때지 안의
위장이 그것을 원하는 한 언제까지고 경남 사천군에 사는 김모 할아버지가 키운 돼지와 전남 곡성에 사는
박 모 할머니가 키운 콩나물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법.
나는 편의점 도시락을 집어들고, 사발면도 하나 집어들었다.
낮시간에 마주치는 여자 알바생은 말이 참 없다. 처음에는 내 마스크가 현상수배범의 그것과 비슷해서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것인가 생각했지만, 술취한 외국인이 시가렛을 외치며 돈을 집어던져도 변하지 않는
표정에서 '아 사람의 속성이 원래 저렇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야간에 나오는 편의점 사장에 말에 따르면 매우 무미건조하게 '그새끼 신고했어요' 라고 했단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뜬금없이 조용필의 모나리자가 머릿속에서 재생되는데...
모아이 석상마냥 말이 없는 그녀는 굳게 다문 입술 사이로 그래도 조금 많이 본 사이라고 그녀가 '봉투 이십원요' 라는 말을
짧게 건넸고, 나 역시 '저번에 열봉지 쓴다고 이백원 줬잖아요' 라고 응수하자 무언가 생각난 듯 '네에...' 라며 봉투값은
따로 받지 않았다.
그 시점에서의 시각 오후 두시 이십분.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회사는 워라벨이 굉장히 좋다.
집에 가봐야 총각냄새나 날거고, 남는 시간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원룸촌 사이로 한줄기 햇살과 하얀 구름을 보는 것도
썩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나는 편의점 앞 한켠에 앉아 메가톤바를 꺼내 한 입 베어물었다. 비루한 인생이라지만,
입속에 퍼지는 메가톤바의 향은 지난날 살아온 내 후회를 잠깐이나마 씻어내 주었다.
근데 그러면 뭐한담? 후회의 결과물은 씻겨지지 않는데?
으레 그렇듯 공장지대가 밀집한 곳에 위치한 원룸촌은 낮시간이 아주 조용하다.
지나가던 고양이하고 눈싸움도 한번 하고, '이리온' 했지만 '봉투안에 든거 줄거 아니면 꺼지쇼'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길래
나도 작별을 고하고. 왠지 모르지만 저번에 비오는 날 날 공격했던 포메라니안이 주인과 함께
가다가 또 덤벼들길래 결사항전을 준비했는데, 주인이 데려가버리고...
반성과 후회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는 돼지같이 두번째 아이스크림을 꺼내들려고 하는데, 그와 눈이 마주쳐버리고 말았다.
날 심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그 여고생.
우린 서로 <니가 왜 여기있냐> 라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실제로 여고생은 우뚝 멈춰선 채 경멸에 찬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
나 역시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였기에 <아이스크림 먹는 아저씨새끼 처음보냐> 라는 눈빛으로 응수했다. 친척형 딸이 너만하다 이
누군가의 조카새끼야.
그런 어색한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 렉스턴 한대가 나와 여고생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갔고, 찰나의 순간 다시 눈에 들어온 그 여고생은
여전히 경멸에 찬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 <이 대낮에 편의점 앞에 앉아 아이스크림 쳐먹는 백수새끼야!> 누가봐도 그런 표정으로.
그리고 난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고 만다.
"회사가 일찍 끝났는데요..."
...니 근무시간을 왜 이야기합니까..?
도저히 사태수습이 안될 것 같다. 순간돌풍이 여고생의 이마를 깐다. 쟤는 이마가 태평양이구나. 나도 저런 주름없는
이마를 가진 때가 있었지. 경멸에 찬 표정이 순식간에 어색한 표정으로, 어색한 표정이 또 연민에 찬 표정으로 바뀔 때 나는 또 한번,
"...아이스크림은 이게 마지막인데요..."
...어쩌라고..?
나는 나도 모르게 '느집엔 이런거 없지' 라는 말투로 두 번째 아이스크림 보석바를 베어물었고, 여고생은 <그 때 내가 잘못 본게 아니였구나>
라는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제 갈길을 갔다. 나 진짜 왜그랬지?!
멀어져가는 그녀석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말이라도 안하면 정신나간놈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었을거란 후회에 빠졌지만
떠나간 기차는 다음차가 없고, 나는 이 동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영원한 미1친놈으로 찍힐 수 있을 것이란 두려움에 휩싸였다.
Malo의 '1994 섬진강'이 너무나 듣고싶은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