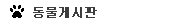반려동물이 떠난다는 것.
그날도 다른날과 다름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같이 밥을 먹고, 쇼파에 앉아 쉬고, 노래를 들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던 날이었다.
행복했기 때문에 소중함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새벽3시. 잠들기 전 와이프가 화장실을 치웠건만, 치워주자마자 보리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본다.
와이프는 투덜댄다.
"꼭 치워주면 볼일본다니깐"
"내가 갈까?"
내가 몸을 반츰 일으키며 말했다.
"아냐 내가 갈께"
와이프는 내가 비염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이 가겠다고 한다.
화장실을 치워주니 신이 나나보다.
보리는 우다다를 하며 침대아래와 주방을 마구 뛰어다녔다.
보리는 보일러를 틀어주면 침대 아래에서 뜨뜻하게 지지는것을 좋아했다.
그날도 보일러를 틀었기 때문에 보리는 침대아래에서 잠을 잤다.
나는 약 3시 30분경 잠이 들었다.
"보리야!"
와이프가 크게 소리쳤다.
나는 잠이 덜깬채로 몸을 일으키며 왜그러냐고 물었다.
"보리가 이상해..."
와이프는 울상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보리는 안방 문뒤에서 누워있었다.
나는 부리나케 달려가 보리를 살펴보았다.
눈이 덜 감긴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듯 보였다.
얼마전에 알아봤던 24시 동물병원에 전화를 하며 와이프에게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 했다.
"벌써 죽었잖아..."
와이프의 한마디에 나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듯 했다.
보리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체온이 다 식지도 않은채, 핑크색 발바닥은 핏기가 사라지며 하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보리의 심장에 손을 대 보았다.
움직이길 바랬던 심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보리는 죽었던 것이다.
새벽 6시 30분경 단 3시간 사이에...
나는 믿기지가 않았다.
밥도 잘먹고 잘 뛰어다녔고, 물도 잘마셨다. 배변도 상태가 좋았다고 한다.
전초 증상이 없었기에 나는 감전된 것이 아닌가 하고 콘센트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뭘 잘못먹었나 싶어 주방과 안방을 둘러보았으나
전혀 잘못먹을만한 것도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구역질을 해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리는 잠든 것처럼 누워있었다. 따뜻한 방바닥을 지지던 그 자세로.
와이프는 새벽녘에 문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늘 언제나처럼 보리가 뭔가를 떨어뜨렸을 것이라 추측할 뿐이었고
큰일이라고는 생각치 못하였다.
나는 잠들면 소리를 못듣기 때문에...
내 무능함이 정말 싫었다.
왜 죽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렇다면 병원에 가 부검을 해야한단다.
우린 그것은 싫었다.
갈때라도 편히 가길 바라는 마음에
우린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평소 좋아하던 담요로 감싸 박스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내 회사 근처의 산에 묻어주기로 했다.
장례업체에 연락해보는게 어떨까 싶었지만
불친절한 곳도 있기도 하고
우리들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낀다는것이 꺼림칙했다.
우리 손으로 보리를 보내주기로 했다.
그것이 겁많던 보리에게도 행복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 3시간 전에 우다다하던 보리의 모습때문인지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나보다.
한순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내 상식속에선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보리가 평소 좋아하던 간식하나와 마따따비(개다래나무)를 넣어주었다.
와이프는 보리가 가장 좋아하던 분홍색 줄을 꺼내와 보리의 위에 얹어주었다.
그리고 와이프는 보리에게 말을 걸었는데
나는 눈물이 너무 나와서 차마 들을수 없었다.
보리를 집근처에 묻어주고 싶었다.
와이프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겁이 많던 보리였기 때문에
언제나 와이프가 볼수 있는 곳에 묻어주고 싶었지만
여건상 좋은 곳이 없었다.
어쩔수 없이 우리는 차를 타고 30분 가량 걸리는 내 회사 뒷쪽 언덕에 갔다.
여기라면 볕이 잘들기 때문에 평소 베란다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보리에겐
틀림없이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면서
보리가 구겨지지 않도록 되도록 넓게 땅을 파면서
꿈이라면 지금 깨라면서 되뇌였지만
보리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땅이 파질때까지
나는 꿈에서 깨지 않았다.
차에가서 보리가 담긴 상자를 들고
보리를 구덩이에 넣기 전에 갑자기 또 눈물이 났다.
와이프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보리의 얼굴을 만져주었다.
이 감촉을 잊고 싶지 않았다.
보리를 차가운 구덩이에 넣는다는게 현실감이 너무 없었다.
얼마나 추을까. 얼마나 무서울까.
가슴이 미어지는듯 했다.
보리가 그나마 차갑지 않도록
와이프는 손수만들었던 쿠션커버를 밑에 깔고
담요채 보리를 들어 거기에 눕혀주었다.
나는 눈물을 닦았던 휴지를 함께 넣어주었고
와이프도 이어 자신의 눈물이 스민 휴지를 넣어주었다.
나는 땅을 삽으로 퍼서 아프지 않도록 흙을 흩뿌려 넣어주었다.
이때 보진 않았지만 와이프는 계속 울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싶지 않아 땅만보며... 보리에게 흙을 덮어주었다.
보리의 모습이 흙으로 덮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나는 주변보다 살짝 봉긋하게 올라오도록
봉분을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옆에가 하얀색 돌로나마 여기가 보리의 묘라는 것을 표시해주었고
와이프는 옆에 피어있던 코스모스를 따와
보리의 머릿맡에 놔주었다.
와이프는 보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안녕" 이라고 말해주었다.
집으로 오는길에 자꾸 눈물이 났다.
우리의 신혼과 함께 보리가 늘 같이 있었는데
이제 보리가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고양이의 수명이 10~15년 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우린 아직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이제 보리 없이 혼자 어떻게 있지?"
와이프가 말했지만 나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고양이를 이제 키울수 없을것만 같았다.
죽음이란 이렇게 참담한데,
다시 이런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다.
늘 집에 가면 쇼파에, 의자에 보리가 앉아서 울어주었는데
이제 보리가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다.
보리 하나 없을뿐인데...
이렇게 집이 텅 빈다.
우리의 생활자체도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집에 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통곡을 하며 오열을 하며 울었다.
우리 보리 어떡해...
불쌍한 보리 어떡해...
혼자 새벽에 아무도 봐주지 않는 구석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보리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눈물이 났다.
휴대폰 사진첩을 보니 온통 보리 사진이었다.
더 잘해줄껄 이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못해준 것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다.
보리를 이제 떠나보내며
자신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이 떠나감을
처음으로 느껴본 나였다.
죽음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렇기에 한 생명을, 소중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작은 동물이기에 쉽게 분양받고 버려지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