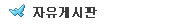음악을 듣다 “씀”이라는 앱에 적어 봤어요.
작성에 몰두 할 수 있는 좋은 앱이네요.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시절 난 정말 미술을 좋아했다.
연필과 크레파스 그리고 손가락은 내게 있어 최고의 미술 도구였고 언제나 커다란 달력의 뒷면은 내 캔버스였다.
찰흙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 오라는 숙제도 가장 좋아했고
겨울엔 눈사람 대신 강아지며 오리며 손이 시뻘게 질 때까지 옥상에 올라가 내려오질 않았다.
고모부가 키우라고 주신 도사견이 한 마리가 집에 있었는데, 너무 순하고 말을 알아들었던 그 녀석 앞에 앉아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고 스케치북 가득 도사견을 그리는 일이 친구들이 놀자며 찾아오거나 저녁 먹으라는 엄마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하교하면 하는 일이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새벽까지 혼자서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것이 취미였고 놀이였다.
부모님 또한 그런 나를 꾸짖은 적이 없었다.
4학년인가, 미술 숙제로 녹두장군과 원시시대의 삶이라는 주제 중 선택해 수채화로 그려오라고 했다.
가장 좋아하는 공룡이 들어가는 주제를 마다할 리 없었고 위인전에서 읽었던 녹두 장군도 흥미로웠다.
물감을 싫어했던 나는 크레파스로 채색을 하고 손가락으로 문질러 나름 최선의 표현을 했다.
그렇게 두 개를 다 그리고 잠든 시간이 꽤나 새벽이었다고 엄마가 훗날 이야기해줬다.
다음 날, 나는 미술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했고 망신과 꾸중을 들었다.
왜 다른 사람이 그려준 그림을 가져왔느냐, 물감은 왜 쓰지 않았냐가 이유였다.
손바닥까지 맞고 집에 가니
“학교에서 전화 왔었다. 그림 누가 그려준 거냐고” 엄마가 말했다.
“엄마, 나 진짜 억울해.”
“엄마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 아들이 잠도 안 자고 그린 그림인데 무슨 소리냐고”
“...”
“미술 선생님이 너 미술부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미술부 들면 뭐가 좋은데?”
“네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릴 수 있겠지?”
다음 날 학교에 가보니 반에서 그림 숙제로 1등을 했고 교실 뒤 가장 높은 자리에 내 그림이 진열되었다.
나는 그렇게 미술부에 들어갔다. 혼자 그림 그리던 내게 남들과 같이 그림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떨리는 일이었다.
고학년들 틈에 껴서 첫날도 다음 날도 셋째 날에도 스케치만 했다.
그런데 그건 본 적 없는 풍경을 그리는 일이었다. 미술 선생님은 소나무가 있고 기왓장이 있는 풍경을 상상해 그리라고 했다.
나중 알고 보니 도대회를 위한 것이었다.
싫은 그림도 계속 그리다 보니 손에 눈에 익었고, 그다음에는 채색을 배웠다.
물감이 정말 싫었던 나는 6학년의 누나가 내 옆에서 기왓장은 이런 색부터 이렇게, 나무는 이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것이라고 알려줬다.
물감으로 칠하는 것도 곤욕인데, 마음대로 색깔을 쓸 수 없는 것은 정말 고문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되니 도 미술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태권도 도장 단심사 볼 때보다 더 떨렸다.
정말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 주제는 역시 풍경화,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풍경이면 되었다.
당연히 한 달 동안 그렸던 것을 그리면 되는 것이었다. 스케치는 배운 대로 했지만 채색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난 장려상을 탔고 미술 선생에겐 또 꾸지림을 들었다. 이유는 왜 기왓장이 빨간색이냐는 것이었다.
난 소나무를 그리지 않았다. 단풍나무를 그렸고 대회에 나간 날이 비까지 내리는 가을이었고
기왓장이 빨간 이유는 비가 내려 단풍이 기왓장에 비추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나를 더 꾸짖지 않았다.
대회 후 2주가 조금 넘었을 때는 이제 슬슬 빌려 쓰지 말고 이제 미술도구를 사라고 했다.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대신 사 줄 테니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미술도구 살 돈 봉투를 다음날 학교 가기 전, 엄마가 가방에 넣어주셨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 등교하자마자 교무실 가서 미술 선생님에게 주라고 거듭 이야기하셨다.
시골에 살던 나는 학교에 늦지 않게 가는 버스를 타려면 시간에 맞춰 500미터는 걸어야 했다.
난 중간 즈음 가다 되돌아왔다. 미술이 하기 싫었고 미술부가 싫었다. 그래서 집 앞 슈퍼 뒷길에 있는 땅을 파고 돈 봉투를 묻어 숨겼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기억은 나지 않는다. 하교하고 다시 꺼내어 엄마한테 주면 될 거라 생각했나 보다.
난 또 미술 선생님한테 혼이 났고 하교 후 집에 돌아오는 길.
묻어두었던 슈퍼 뒷길에 가서 다시 팠지만 마법처럼 돈봉투는 없었다.
분명 그 위치였는데 아무리 아무리 파고 찾아도 없었다.
겁이 너무나 부모님께 당장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분명 혼날게 뻔했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엄마, 아빠에게 저녁을 먹다 조심스럽게 사실을 말했다.
말을 하다 보니 난 너무 서럽게 울었다. 입에 있던 밥알이 죄다 밖으로 나갈 만큼 입을 한참 다물지 못하고 울었다.
“미술부 하지 말자. 억지로 하는 거 하지 마. 그만 울어 뚝.” 엄마가 날 안아주며 내게 했던 말이다.
“하지 마 임마. 그냥 집에서 혼자 그려. 그만 울고 밥 먹어. 남자 놈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다.
이게 내 기억이고 집에 가서 고기에 맥주 한잔할 때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다.
너무 쉽게 그렇게 더 이상 나는 미술을 하지 않게 되었다.
35살이 되고 미술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난 다시 미술이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