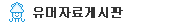오늘 난 훈련통보를 받았지.
그리고 메일을 열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어.
어디서 뭘 또 군대다녀온지 6년이 지난 나를 또 불러내냐..
그리고 쿠팡의 메일에 올ㅋ 대박ㅋ
제대로 노림수네.
뭘 누리라는 거냐 응?
3월 8일 10시 21분.
오늘 저녁은 손님이 없다.
무심결에 또 내 오른손은 핸드폰을 키고 카카오톡을 접속하고 있었다.
새로 온 연락은 없다.
종료 버튼을 누른다.
무심결에 또 내 오른손은 핸드폰을 키고 카카오톡을 누르고 있었다.
새로 온 연락은 없어.
별 생각없이 그동안 신경쓰지 않았던 채팅방 목록을 죽 내려본다.
사장님에게 보내는 일일결산, 별별 게임들로의 초대, 답장이 없이 묻혀버린 다른이들과의 채팅들.
슥슥 거침없이 내려보던 내 손길이 일순간 멈춰선다.
그녀의 이름이다.
그녀의 이름 오른쪽 밑에는 내가 저번 날에 술을 먹고 남겼던, 그 새벽에 보내놓고 몇번이고 다시듣던 음성메세지가 자리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들은 것은 한달 전이였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건 한달 반 전이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쓰다듬은 것은 47일 전이고,
마지막으로 키스한건 47일 하고 반나절 전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한다 말했던 건 전주에 눈이 마지막으로 오던 엊그제이고,
마지막으로 그 녀석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건 새해 정초였다.
카카오톡의 이야기들을 거슬러 올려다본다.
거꾸로 보는데도 나에게는 바른 방향으로 읽혀진다.
이 문자를 보낼때는 내가 차를 타고 있었지.
내가 손님을 대하다 문득 보고싶어 밖에 나가 채팅을 하나 남기고 다시 들어갔지.
담배를 피면서 왼손 중지와 검지 사이에 담배를 끼우고 약지와 새끼 손가락에 폰을 기대어 보면서
오른손으로 다시 핸드폰을 들고 답문을 썼다 지웠다 하던 세달 어린 나.
몸에 열이 많은 그 녀석은 틈만 나면 집을 환기시키곤 했다.
눈을 참 좋아해서 나에게 눈이오는 사진을 겨울 내내 보내곤 했었다.
신경쓰지 못해도 항상 뭐라고 한 적이 없었다.
힘들다고 칭얼대다가도 얼마 못하고는 또 웃고 힘낸다며 아자아자! 라는 말을 주문처럼 하던 여자다.
흥에 겨워 엉덩이를 우스꽝스럽게 흔들며 춤을 추면서
기분좋아 기분좋아 헤헤거리던 그 웃음을 보면 참지 못하고 꼭 안아주던 내가 생각난다.
하나하나 쓰여진 문자마다 그 녀석만의 억양있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미 식을대로 식어 굳어버린 시간 사이에서 아직도 그 문자들은 여전히 나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 표현할, 표현하고 있어야 할 때
넌 겨우 받아내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덕분에 지금 나는
널 만난 시간보다 헤어진 시간이 더 길어졌음에도
아직도 네 이름에 두근거리고
아직도 네 생각에 힘들어하고
아직도 널 내 마음에서 수술해 낸 그 충격에 소리도 못 낼 정도로 괴로워한다.
그냥. 그렇다.
아니. 전혀, 그렇다.
그렇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