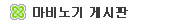* 제목을 저렇게 정해놓고 대체 '누군가'가 누군가?! 하는 사람입니다. 망했습니다.
* 제목 때문에 6편을 쓸 거 같습니다. 망했습니다22222
* 이전에 쓴 글들은 나중에 보완할 수밖에 없는게 퇴고도 없이 그냥 막 올리고 있습니다. 묵혀두면 죄다 까먹어서 차라리 기억날 때 얼른얼른 진도 끊어두는 중입니다.
감응할 때마다 그 목소리가 익숙해지는 것인지, 혹은 원래부터 익숙했던 것인지 이젠 밀레시안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 익숙함이 단순히 지속적인 교감 때문이라기엔, 기묘할 정도의 친숙함을 그런 단어로 정리하긴 어려웠다. 어떤 의미로 각인이라면 각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밀레시안이 정신을 다잡았다.
[밀레시안? 괜찮은가?! 방금 그건...]
말이 군데군데 끊겼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다 그나마 제대로 들은 것은 저 문장 하나였다.
“아, 느낌이 이상하네요. 잘 들리고 있는 겁니까?”
[자네 역시 느낀 것 같군. 아무래도 이 연결. 교감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는 것 같네. 나만의 느낌인 줄 알았는데... 예전보다 자네에게 닿는 일이 어려워졌네. 우리 사이를 가리는... 장막이 두터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간 저 쪽에선, 이 쪽을 ‘본다’는 느낌에 강할 정도로 강한 교감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 단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였다. 밀레시안 또한 그에 수긍하려 하자 그가 혼잣말같은 말을 내뱉었다.
[뭐... 내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어차피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겠군.]
‘...그런건가.’
과거의 그의 삶에 끝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교감이라면 밀레시안의 우려하는 감정도 읽어내진 못했으리라.
[방금은... 어떤 하얀 공간을 헤매는 자네를 보았네. 지금 보니 그건... 역시 함정이었던 것 같은데... 자네, 괜찮은 건가.]
“일단... 은요?”
희미하게 웃는 소리까지 전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에 단장이 안도한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 함정이 자네와 기사단에게도 발동하다니... 아무래도 이상하군...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면, 발동하는 대상은 분명...]
그의 의도대로라면 선지자들이거나 이교도들였어야 할 것이다. 밀레시안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미래엔 이렇게 바뀌어 있었다.
[하긴, 실반 드래곤 같은 수호자들도 변했으니. 함정이 온전하리라 기대하는 건 무리일 수 있겠군.]
그의 말에 긍정하는 말을 보냈지만, 정작 이 반응이 끊겨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그대로 저 편에서 말이 이어졌다.
[그나저나... 자네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이는 아마 남은 한 명의 조장인 것 같은데. 저 자인가?]
뚜둑, 뚜둑. 끊기는 교감 속에서 간신히 귀를 기울여 들린 말에 밀레시안이 자연스레 톨비쉬를 쳐다보게 되었다. 광물에 갇힌 기사단원들이 걱정되는 지 일일이 두드려보며 교감을 시도하고 있었다.
“네.”
[그렇군. 비록 교감의 상태가 좋진 않지만, 안정적인 신성력이 내게까지 전해지네.]
과연 최강의 기사인가, 하고 밀레시안도 납득하려던 순간,
[잠..... 깐, 뭔가 문제가-]
뚝.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이전까지 없던 고요함이 밀레시안을 덮쳤다.
“....어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대검을 살펴본 밀레시안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간 느껴졌던 기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말 그대로 고철덩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교감을 다시 시도해봤지만 헛방이었다. 더 이상 과거로 교감을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방법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데도 시도하는 일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몇 번이나 교감을 시도하다 포기한 밀레시안이 대검의 일부를 가방에 넣었다. 해도 안 될 바라면 차라리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자며 톨비쉬를 따라 알반 기사단의 기사단원들을 한 명 한 명씩 살펴보며 교감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한다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하필,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이 밀레시안의 눈에 비쳤던 것일까. 대체 미래의 자신이 무슨 선택을 하기에?
연결이 불안정해서 망정이지, 놀란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쓴 게 괜한 짓은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밀레시안은 그것을 몰랐지만, 안 그래도 불안정했던 교감은 그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그대로 끊어져버렸다.
“끝났군.”
지금은 부러지지 않은 채 제 모습을 유지하는 대검 손잡이를 가볍게 훑으며 단장이 중얼거렸다.
구체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감응하면서부터 원래부터 이루었어야 하는 목적이 바뀌고, 그로 인해 단원들도, 또 사제들의 미래도 바뀌었다. 심지어 마지막에 본 자신의 모습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본디 자신은, 죽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굳이 말하자면 죽는다기보단 조금 긴 꿈을 꾸는 것. 같이 떠나온 이들이 바친 성스러워야 할 목숨이 의미를 잃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충격적이었다.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미래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그의 행보는 연결될 때마다 신앙심으로 뭉쳐져 있던 자신의 마음을 한껏 흐트려놓았다. 이것이 시련이라면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최악의 시련이었다. 그를 대신해 선지자들과 이계의 신들과 대적하는 밀레시안이 되려 그들과 같은 동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로 감각이 흐려졌다 돌아오기를 번복했다.
밀레시안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안배하는 것은 끝내 자신의 의지였음에도.
그런 미래를 만든 것은, 보고 싶었던 것은 결국 자신의 뜻이었는데.
눈 앞엔 성소가 보였다. 이제 자신의 육신을 바치면 성소와 아발론은 기나긴 영면에 들고, 더 이상 이계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성소에 온 이들의 소망이자 목표였지만, 마지막에 단장 자신이 바쳐진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반대했는데 결국 이젠 곁에서 말릴 이조차 없었다.
“그 밀레시안이라면 말렸을 지도 모르지.”
피식 웃음이 새었다.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어딘가 자신과 많이 닮은 존재. 하지만 알반 기사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호의로 똘똘 뭉쳐 움직이는 이.
그리고 그런 그와 함께 있는 미래의 자신.
“...젠장.”
성소와, 또 그의 직위와 어울리지 않게 낮은 욕지거리가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대체 왜 그 곳에 자신이 있었을까. 육신을 바쳐 성소를 정화하고 봉인했어야 하는 자신이, 대체 왜.
과거의, 지금의 자신이 내린 결론이 미래에선 틀렸다고? 자신을 바쳐도 성소를 봉인할 수 없단 말인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아튼 시미니의 뜻을 받드는 종이자 차마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주신의 첫 번째 검인 자신이, 오롯이 그를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
바람이 스산하고 하늘의 별은 어여쁘게 반짝이는 지독한 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