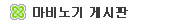* 저번 글과 같이 공식쉐리덜~~ 이렇게 엔딩을 냈어야 했냐 ㅅㄲ덜~~~~ 하면서 쓴, 아까보단 쪼끔 긴 소설.
* 이번엔 3인칭! 그리고 최종보스전!
* 이번에도 세세한 대사 오류는 넘쳐나지만 맥락은 ㅁ... 맞겠죠 뭐.
밀레시안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들을 괴물이라고 불렀다. 실상 틀린 말은 아니었다. 몇 번이나 외형을 바꾸고 살아가며, 모리안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고, 또한 눈 앞에 있는 이 밀레시안은 모리안에게서 에린의 수호신이라는 이명까지 얻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그 밀레시안인 것을 톨비쉬도 안다. 지금 눈 앞에서 현현한 '사도'의 가면 속 눈동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는 와중에도 고요했다. 무엇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는 것인가. 아튼 시미니의 뜻대로 행했다는 자신마저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는데!
"밀레시안.... 당신마저 사도가 된 겁니까...?"
분명 겉모습은 사도였다. 후손들과 싸워왔던 수많은 사도와 비슷한데 그 기운은 처음 느끼는 기운이었다. 사도로 현현한 뒤 변한 외형적인 모습은 누더기나 다름없던 그간의 사도들과 달리 정갈하다 싶은 순백과 검정, 그리고 금빛이 어우러진 모습이었다.
"이게 무슨...!"
신의 뜻을 듣는 자. 그 또한 인간이되 보통의 인간과 다른 삶을 살아왔다. 신의 뜻을 섬기고, 그 섬김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 앞에 있는 이 밀레시안, 아니 사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피네와 비슷한 경우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당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결국 이세계의 힘을 받아들여...."
톨비쉬가 끝까지 말하려다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신이 되었군요."
저지먼트 블레이드가 허공에 여섯자루가 생성되었다. 사도를 해치는 스킬 중 이만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톨비쉬가 본 것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실드 오브 트러스트였다.
".......어, 어째서...?"
사도이자 밀레시안은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른다. 아마 반신화처럼, 이번 '이신화' 또한 에린에서 처음 있는 일일테니까.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처음 있는 일, 세계의 논외같은 일은 꼭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만 적용되었다.
'결국 난 에린에서 언제나 논외적인 존재란 말이지. 좋던 나쁘던.'
에린에 와서 직접 신을 만났으니 망정이지, 여전히 밀레시안은 특별히 신앙심이 깊거나 하지 않았다. 아튼 시미니에 대한 것도 그랬다. 그 초대 단장마저 경악에 찬 눈으로 쳐다보는 건 이 세계에서 존재한 적 없던 경우라는 얘기가 된다.
[....이런 존재는 지금까지 존재한 적 없었단 거겠지, 톨비쉬?]
"!"
눈 앞을 가리고 있는 게 영 거슬리긴 해도 시야를 가리는 정도는 아니었다. 분명 놀라고 있었다. 실은 밀레시안 자신 쪽이 더 놀라야 하는 상황인 거 같은데도.
"당신.... 대체....!"
[아까 그랬지, 자신이 틀리지 않았기에,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의 뜻을 섬긴다고 말야.]
밀레시안도 그 말이 틀리다거나 할 생각은 없었다. 각자의 신념에 맞게 사는 것이 인간이고, 톨비쉬는 그리 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등에 칼이 꽂힌 건 기분이 좀 싱숭생숭했지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게 옳기에, 아튼 시미니도 당신의 뜻에 묵인하는 게 아니냐고 그랬던 거 같은데.]
밀레시안의 눈은 아까와 같이 고요한 빛을 띈 채 톨비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 눈에 비친 난 뭐지? 이계의 신이기에 퇴치되어야 할 자인가? 아니면, 아튼 시미니의 힘을 쓸 수 있기에 에린을 지켜야 할 자인가?]
"밀레시안!"
[나도 잘 몰라. 다만 이 힘으로 지킬 수 있다면, 구할 수 있다면. 난 아무래도 괜찮을 거 같거든.]
자신이 내뱉은 말인데도 호구같은 말에 쓴웃음이 가면 밑에서 흘러나왔다.
[당신의 신앙심을 흔들고자 한 건 아닌데 그런 존재가 되어서 유감이군.]
"나는..."
[가능하면 안 다쳤으면 좋겠다만.]
"...현혹하는 말이군요. 제 믿음을 현혹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대한 나무가 부러진다면 저런 느낌일까. 지금 그의 눈동자에 보이는 사도, 아니 이계의 신은 흉측하게 문드러져 보일 것이다. 악마나 다름없을 지도 모른다.
"어디까지 절 기만할 셈입니까!"
그림 리퍼 둘이 쌍낫을 휘둘렀다. 충격에 톨비쉬의 관이 뒤흔들리는 와중에도 우아하게 보일 만큼 가볍게 피한 밀레시안이 손 끝에 검고 작은 빛을 그러모았다.
- 이미 먼치킨이었지만 더욱 더 먼치킨이 되가는 밀레시안... 무섭다....
- 후반으로 갈수록 멘붕하는 톨비쉬를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공격난무! 하지만 이신에겐 통하지 않았다!
현실은 열심히 피하고 열심히 게이지 맞춰서 쏴재끼지만요...
- 직전 올린 글과 중간이 숭덩하긴 했지만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