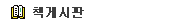꿇어라! 이것이 책게의 화력이다.
============================================================================================
가난해 빠진 나는 그물을 곁에 두고
던진다 허공으로 날린다 바다 아래 깊숙히 깊숙이 한 자, 한 자 낱자가 사라지도록. 글자가 부서져내린 바닷속에는 진공이 가득차 있다. 염원이 닿지 않는 거리다. 애도가 되어버린 슬픔이 맥을 못추고 풀린 날실처럼 너울너울 그렇게 흐르다 결국 붉은 해초와 함께 얽혀 죽음과 하나가 되었다 눈물의 값은 바다의 물보다 옅다. 수맥안으로 다시 감춘다. 넣어둔다. 속인다.
노력은 이상과 달라 하늘은 바다와 달라
간절한 기도는 꿇는 무릎과 비례하지 않았다. 조아린 머리와도 같지 않았다. 상승에 상승을 더해야 할 곡선은 반비례를 타고 미끄러져내려왔다. 당연하다 여긴 것이 당연하지 않음에 내가 가진 상식은 몰상식이 되었다. 주류를 등돌린 홀로섬에 분노는 끝이다, 끈이다, 잘려나갔다.
부득이한 고통은 공통의 죄악감에 부쳐
이곳은 난장이다. 흑암의 부활을 원하고 또 원치 않는 지옥같은 난장판이다. 서로를 물고 뜯고 찢어발기면 어느샌가 네 편도 내 편도 모두 사라져 버린 합판에 홀로 남는다. 그 고독은 바다와 같다. 깊고 푸르고 다가설 수 없다. 축적된 분노는 피로에 잠겨 모두 잠에 빠진다, 조잘대는 것들이 새가 되어 날아가고 새 대가리의 남은 이성은 12시에 맞춰 째깍이는 뻐꾹이와도 같다. 뻐꾹, 뻐꾹, 뻐꾹 울어대다 진심으로 돌이켜본 것들을 세월에 묻는다. 첨벙.
그리도 나는 변화에 굴종할 자신이 없어
그리고 또한 내게 다가올 변화는 없어. 간절히 바라고 또 빌어온 모든 것들이 실망이란 종자 속에 감춰져 대지에 묻혔다. 또 하나의 슬픔이다 안타까움이다. 못내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스물스물 새로운 싹이 되어 흐른다. 시내로 강으로 바다로 자라난 것은 너의 티끌같은 목소리. 모두가 들었다 말하나 존재하지 않았다 믿어지는 죽은 희망. 그럼에도 간절히 바라옵건데
나는 그대가 지지않기를. 말 없이, 간절히...
============================================================================================================
병신백일장에서 진지먹은게 병신포인트.
...라고 주장해봅니다. 그냥 다른 글들 보는데 마지막 줄 볼때마다 괜히 울컥해서 쓰고 싶었어요.
저도 아직 세월호를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