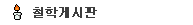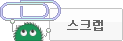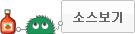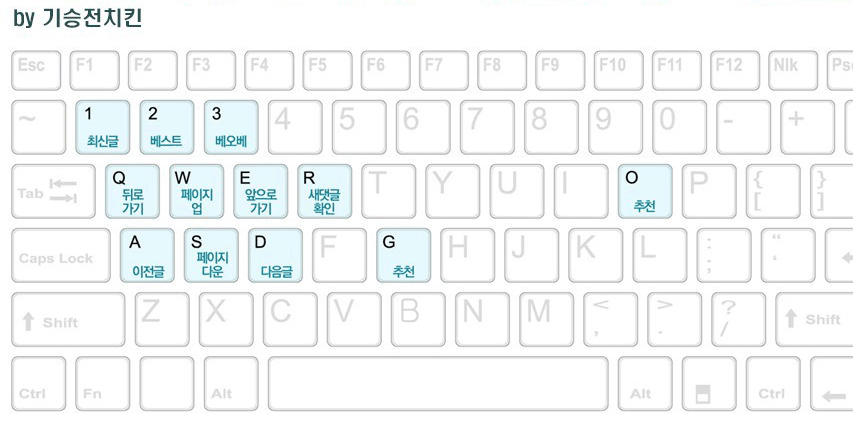1내가 죽었다.
2나는 왜 죽었는가?
세포들이 더이상 원활히 재생되지 못하여 죽었다.
3나는 왜 세포들은 재생력을 잃었는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변화란 필연적인 결과이자 상태이다. 따라서 재생력있는 세포의 상태는 재생력없는 세포의 상태로 귀결된다.
4세포의 재생력이 있는 상태, 나의 삶은 왜 있었는가?
ㄱ태어났기 때문이다.
a나는 왜 태어났는가?
섹스의 결과로 태어났다.
ㄴ살아가기 때문이다.
a나는 왜 살아가는가?
그냥 살아간다.
5나는 왜 섹스를 하고, 왜 그냥저냥 살아가는가?
생명은 불쾌(나쁜상태)를 피하고 쾌락(좋은상태)을 추구한다. 나쁜상태에는 배고픔, 졸림, 꼴림, 추위, 더위, 소음, 악취, 통증 등이 있으며 생명은 이것을 피하기위해 좋은상태를 추구한다. 생명에게 좋은상태는 나쁜상태를 우선으로 하여 추구되는 것이기에 생명이 쾌락(좋은상태)을 추구하는 활동은 수동적, 맹목적이다. 또한 생명에게 나쁜상태는 그 자체로 나쁜것이다. 즉 배고픔은 배고픔 자체가 나쁜것이지 배고픔으로 인한 영양부족, 아사 등은 생명에게 나쁜것의 본질이 아니다(직접적으로 나쁜게 아니다). 만약 누군가 3일을 굶었다면 그는 살기위해 음식을 원하는게 아니라 오직 음식을 먹기위해 원한다.
그래서 4ㄱ꼴림은 생명에게 나쁜상태, 불쾌한상태이며 이를 피하고 좋은상태를 추구하기 위해 섹스가 이루어지고 내가 태어났다. 4ㄴ꼴림, 졸림, 배고픔, 추위 등의 나쁜상태는 그 자체로 나쁜것이여서 생명은 이상태들을 피해가며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간다.
<<논외로 '태어남'은 흥미로운 주제이다. 임신부의 진통과 분만은 임신부를 주체로 해서 일어난다. 결국 아기는 능동적으로 태어났다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낳아졌다. 자궁과 질에서도 우리는 수동적이고 맹목적이였다.>>
6나는 왜 배고픈가?(나는 왜 나쁜상태가 되는가?)
여기서부터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일단 가설은 이렇다.
배가 고파지는 이유는 음식의 맛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배고픔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몰입상태에서는 생각이 제한되어 시간가는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배고픈 줄도 모른다. 음식을 생각하는건 맛에 대한 기억의 축적이다. 그렇다면 갓난아기는 맛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갓난아기는 음식을 먹으려는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빨기만 할뿐이다. 그래서 위가 비었든 꽉찼든 입에 들어온건 무조건 빤다. 젖을 빨아 젖의 맛을 알게되면 이러한 경험과 기억들이 뇌에 축적된다. 이제 아기는 젖을 달라 울어대는데 이건 배고파서 우는게 아니라 맛있는 젖을 탐미하기 위해 우는 것이다! 맛에 대한 욕구가 배고픔의 본질이다.
오감은 사실 촉감만으로 포용되는데 시각은 눈과 빛의 접촉, 후각은 점막과 화학물질의 접촉, 청각은 고막과 진동의 접촉, 미각은 미뢰와 화학물질의 접촉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신경세포와 자극물질의 접촉으로 인해 기억이 축적된다.
7나는 왜 기억하는가?
내가 행하였기 때문이다.
8나는 왜 행하는가?
할수 있기 때문이다. 본능이다.
9나는 왜 할수 있는가?---
---(여기까지가 내가 할수 있는 답이다)
/
이렇게 나의 모든 행동이 기억을 쌓고, 쌓인 기억들이 불쾌한 상태를 이끌어내며, 불쾌한 상태가 살아감의 본질이 되어서, 살아감은 죽어감이 되고, 결국 나는 죽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모든 행동(움직임, 말,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죽음에 끌려가는 상태가 아니라 죽음에 다가가는 상태가 된다. 죽음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는 그냥저냥 살아가는 삶과 다를바 없어 보이지만 삶의 만족감은 이루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행동이 통제되면 쌓이는 기억도 통제되며, 쌓이는 기억이 통제되면 불쾌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불쾌한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게 아닌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 삶과 죽음을 초탈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배가 고파서(배고픔은 맛에 대한 욕구) 음식을 먹는게 아니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