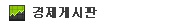[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부총리·장관·여당 한 목소리...6000원대 진입 분위기 만들기 총력]
2016년 최저임금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 카드를 이른 시점에 꺼내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여당도 곧바로 화답했다. 최 부총리 강연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디플레이션 대응, 양극화 해소,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당정과 여야 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소 늦긴 했지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비슷한 시점에 최저임금 이슈에 불을 붙였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에 격차해소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 근로자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격차해소는 박근혜 정부의 기본 철학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임금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완책을 약속했다.
정부가 노골적인 적극성을 보이면서 올해 진행된 2016년 최저임금 논의는 사상 최초로 '대폭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진행됐다. 구체적인 선택지도 나돌았다. △첫 6000원대 진입 △현 정부 최대인 10% 인상 등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6030원을 넘어설 경우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6000원을 살짝 넘는 금액으로 인상이 논의 초반부터 유력했다. 첫 최저임금 6000원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는데는 이 같은 정부의 밑그림이 크게 작용했다.
구조적으로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사용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역학관계 상 사실상 최종 결정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공익위원들의 안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공익위원들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는 지적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왔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