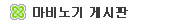제목 ㄷㄷ 붙일게 없어요ㅠㅠ
톨비쉬도 한 번 차여보면 어떨까 싶어서 연성하긴 했는데....는 아니고,
내용이 길어져서 나누었어요. ㅜㅜ
톨비쉬의 말이나 행동에 질려버린 게 언제부터였더라. 특별조의 훈련을 지켜보던 그녀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이런 걸 질려버린다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지쳐버린 상태였다.
이용당하고 배신당하는 것에 익숙해진 그녀였다. 그래서 톨비쉬의 말과 행동을 무한정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계속 곁에 있겠다는 말도 덥석 물 수 없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톨비쉬는 곁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주었다. 루에리와는 다르다고. 타르라크와는 다르다고. 불안해하는 그녀를 따로 불러 변하지 않을 약속을 해주었다. 그가 섬기는 단 하나의 유일한 신인 아튼 시미니를 건 맹세에 그녀는 겨우 톨비쉬를 믿게 되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톨비쉬는 변하지 않는데 그녀가 변하고 있었다. 항상 함께 있다 보니 질린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 톨비쉬가 싫어진 건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마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정말 톨비쉬를 좋아하는 걸까.
요즘 그녀가 하고 있는 최고의 고민이었다. 얼굴만 봐도 좋고 설레던 때가 있었다. 임무 때문에 떨어지게 될 때면 시간이 빨리 흐르지 않아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며 지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사라져버렸다. 톨비쉬가 임무에 가게 될 때면 잘 다녀오라는 말을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다. 그가 돌아오는 날을 잊은 적도 있었다. 왜 벌써 왔느냐는 그녀의 말에 톨비쉬는 눈에 띄게 서운한 기색을 보였었다. 하지만 그녀는 삐친 톨비쉬를 풀어주는 것에 예전처럼 열을 올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그대로 내버려뒀을 뿐이었다.
그녀가 변하는 것을, 이미 변한 것을 톨비쉬 역시 느끼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하던 것처럼 대하는 그 모습이 그녀는 보기 싫었다. 일부러 없던 일까지 만들어 톨비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까지 했다. 어쩌면 영원히 살아갈 수도 있는 그녀였기에 수명이 유한한 그가 걸림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싫증이 나버린 것 같았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함께 있게 된다면 다시 그에 대한 마음이 예전처럼 돌아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잠시 쉬고 있는 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그녀가 자리를 떴다. 이대로는 안 될듯했다. 이대로는.
“아직 훈련 시간 아닌가요?”
갑자기 엘베드 조로 쳐들어온 그녀를 톨비쉬는 웃으며 맞이했다. 그가 조원들을 뒤로하고 그녀를 자리로 안내했다.
“바빴던 거예요?”
“아니요. 바쁘다 해도 없는 시간이라도 내야지요.”
다정한 말과 목소리에 그녀는 어서 빨리 톨비쉬의 앞에서 벗어나고 싶어졌다. 그의 이런 면이 그녀를 숨 막히게 만들었다.
“저. 톨비쉬.”
“네.”
그녀와 같은 벽안이 그녀를 올곧게 바라보았다. 재촉하지 않는 것도 그녀를 옭아매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먹었으니 어서 빨리 말해야 하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바싹 말라가는 입술을 애써 무시한 그녀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바로 잡았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끝냈으면 해요.”
일부러 톨비쉬의 눈을 더 똑바로 바라보고 글자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겨우 마음을 다잡았는데 아직도 불안한 게 남아있기라도 한지 온 몸의 맥이 펄떡펄떡 뛰었다. 피부가 뚫어질 것처럼 뛰어대는 통에 식은땀이 솟아났다.
“알겠습니다.”
“네?”
그녀의 입에서 얼빠진 말이 튀어나갔다. 원래 이렇게 쉬운 건가.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게 이리도 쉬운 것이었나. 머릿속에서 의문이 마구 휘몰아쳤다. 그녀가 아는 이별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무거운 것이었다. 톨비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 그런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당혹스러움에 물든 그녀의 얼굴을 톨비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주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알겠다 한 건데 무슨 문제라도?”
“아니. 그건 아닌데......”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나. 그건 절대 안 된다며 부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나. 그녀는 분명 톨비쉬에게 지쳐있는 상태였다. 일부러 피하기까지 했었는데, 얼굴을 마주하기도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제와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녀는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던 걸까. 아튼 시미니까지 걸고 변하지 않겠다 맹세 했으면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나.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당황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녀를 보던 톨비쉬가 일어섰다.
“저, 다시 나가봐야 합니다.”
“네?”
“전 이제 나가봐야 하니 당신도 이만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톨비쉬의 말에 묘하게 날이 서있었다. 그녀에게는 절대 보인 적 없는 말투였다. 선채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적응되지 않았다. 되도록 키를 맞추어 눈을 마주해주던 그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다. 이렇게 바로 변해버릴 수 있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그녀는 더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뭐하고 계십니까.”
“아, 네. 나가요. 나갈게요.”
밍기적 일어선 그녀가 톨비쉬가 열어주는 문 앞으로 다가섰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문지방 하나를 건너지 못하고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다. 그녀는 이제야 후회가 밀려왔다. 그렇게 충동적으로 할 말이 결코 아니었다. 뒤늦게 밀려드는 후회는 그녀를 뼈저리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