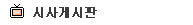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1] 환자 주머니 털어 제약회사 배불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할 당시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 2월 <국정 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한미 FTA를 통해 낡은 일본형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의 말대로 한미 FTA의 진짜 목적은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제도가 김현종의 말대로 결코 '선진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의료 제도다. 미국의 의료 제도는 영화 <식코>에서 잘 표현된 대로 국내 총생산(GDP)의 17퍼센트를 의료비에 쓰면서도 인구의 6분의 1이 보험증이 없고 약값은 가장 비싼 나라다.
그의 말대로 이러한 미국의 의료 제도가 한국에 이식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국민 대다수에게 재앙일 것이다. 한미 FTA로 한국에 이식될 의약품 제도나 영리 병원 등에 관한 조항 등을 보면 한미 FTA는 미국 의료 제도의 이식, 즉 의료 민영화로의 방향 전환이다.
한미 FTA 내용 중 의약품에 적용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살펴보자. 이 제도는 미국에만,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만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의약품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다국적 제약 회사의 특허 약에 대해서는 20년의 물질 특허가 적용된다. 이 기간이 끝나야만 값싼 복제 약품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더 늘어난다. 특허를 여러 개 걸어놓고 다국적 제약 회사가 계속 특허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다국적 제약 회사들은 특허 기간을 1년만 연장해도 수십억 달러의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 회사가 의약품 하나로 1년 동안 버는 돈이 1조 원이 넘으니(이러한 의약품을 그들은 '블록버스터'라고 부른다) 어떻게든 특허를 연장하려는 시도는 다국적 제약 회사로 봐서는 목숨을 건 시도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특허 때문에 전 세계의 HIV/에이즈 환자들은 1년에 300만 명이 약을 구경해보지도 못하고 죽어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후진국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의약품 특허가 연장되면 그만큼 값싼 복제약(카피약)이 시판되는 것이 늦어지고 이 부담은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즉 국민들이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게 된다.
의약품 제도에서 한국에 이식되는 제도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값을 결정했다. 다국적 제약 회사가 불만이 있어도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 약을 안 판다고 우기거나(노바티스의 글리벡이 대표적 예다) 소송을 걸어야 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비준되면 이 약값 결정 과정은 "독립적 검토 기구"라는 관문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기구는 한국 정부는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임기 내에는 그 구성원을 파면할 수도 없는 기구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 제약 회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 독립적 검토 기구는 한국 정부가 약값을 결정해도 거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 회사가 참여한 기구가 약값 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거부권을 가지게 된다면 약값 상승은 당연할 것이다. 나는 지금 가정법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이러한 독립적 검토 기구가 도입되는 것이 한국이 전 세계 최초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독립적 검토 '절차'만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고 이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건강 보험(메디케어)의 약값도 보험 회사와 제약 회사가 결정하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약 회사가 약값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전 국민건강보험을 하는 어떤 나라도 제약 회사에게 약값 결정 권한을 맡기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약값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한국의 약가는 미국의 35퍼센트 정도다.
약값이 얼마나 오를까? 대폭 오를 것이다. 당장 약값 폭등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대로 10년에 1조 원 정도 더 부담하면 될 것이라는 계산은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에 3~4조 원의 약을 파는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1년에 1000억 원 더 판다고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협회(PhRMA)가 한미 FTA를 그토록 환영하고 칭찬하는 성명을 내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05년 미-오스트레일리아 FTA를 통해 한국보다 조금 나은 의약품 협정을 맺었다. 그전까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약품제도(PBS)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강력한 약가 통제로 유명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약품 제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미-오스트레일리아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도 참여한 토머스 폰스(Thomas Faunce)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대학 교수) FTA 이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마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적 의약품 제도가 붕괴했다'고 평가한다.
특허 약품에 대해 약값을 높게 책정해주는 제도가 생겼고, 특허약 약값은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국내 제약사들은 기반이 취약해져서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지금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실제 정반대의 결과다.
2000년 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환자들의 투쟁이 있다. 만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라는 약을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제약 회사가 한 알에 2만5000원으로 받겠다고 주장하자 백혈병 환자들은 거리로 나섰다. 약을 먹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4~8알, 한 달에 300~600만 원은 너무도 비싼 약값이었다.
병마과 싸워야할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한국의 노바티스 앞에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약값을 내리라고 시위를 해야 했다. "약이 없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가 그 구호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환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시위에는 나오시지 말라는 이야기에 "나는 어떻게 되든 뒷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셨던 그 분들의 말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 2001년 노바티스 한국 지사 앞에서 열린 글리벡 약가 인하 시위. 사진의 환자는 실제 백혈병 환자들이었고 이 중에는 고인이 된 이도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 FTA는 이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약가 적정화 방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협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 약가 적정화 방안으로 5년 동안 5조 원의 약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미 한미 FTA 체결 이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약값 인하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이제 이 약값 인하 방안에 종지부를 찍고 되레 약값을 올리는 정책으로 바꾸려 한다.
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특허 약품에 높은 약값을 책정하도록 하고, 특허를 연장하며, 제약회사가 약값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거부 권한을 가지게 하다니. 제 정신이라면 도저히 도입할 수 없는 제도다. 이것이 한미 FTA다.
한미 FTA는 약값을 대폭 상승시킬 미국의 의약품 제도의 한국으로의 이식이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정으로 인해 얻는 이익은 정확히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이익이다. 또 꼭 그만큼 손해 보는 것은 한국의 환자들과 국민들이다. 이를 다른 말로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한미 FTA는 환자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협정이라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4090340§io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