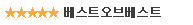나이 서른에 '엄마'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나는 '엄마'라는 고유 명사가 더욱 친근하고 소중하다.
몇 개월 만에 집에 왔다.
평소때 활짝 웃는 얼굴로 '아들왔네~'라고 얼른 내 짐을 받아 주시던 엄마가
이 날은 왠일인지 자리에 누우신채 나를 올려다보시고 힘없는 미소를 짓고 계셨다.
나는 별 생각없이 '저 왔어요'라고 말하고는 내 방으로 올라갔다.
샤워하는 동안 문득 점심을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나서 엄마에게 소리쳤다.
"밥 좀 차려주세요! 점심 안 먹고 왔어요!"
대충 샤워를 끝내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찌개와 햇밥이 담긴 식탁을 기대하며
부엌에 가보았지만 식탁에는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고 텅 비어있었다.
"엄마!"
약간은 씩씩대며 안방에 가보니 내 말을 듣지 못하셨는지 엄마는 아까처럼 누워계신채
나를 보고 계셨다.
"엄마! 밥 못 먹었다니까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
"들었는데 왜 안 차려주는거에요! 치...오랜만에 아들이 왔는데 반겨주지도 않고..."
엄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목까지 덮고 계시던 담요를 천천히 제치시고 말을 이으셨다.
"밥? 미안하다. 에고 오랜만에 온 아들한테 당연히 밥 차려줘야지. 엄마 좀 도와주겠니?"
"응?"
제쳐진 담요옆에 마른 피로 여기저기 얼룩덜룩한 하얀 붕대가 눈에 확 들어왔다.
한쪽 팔과 어깨 전체에 부목를 댄채로 몸을 약간 일으킨채 엄마는 성한 손을 나에게 내미셨다.
"어 어 어..."
"엄마 좀 일으켜줘라"
"어 어 엄마..."
엄마는 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아무렇지 않다는듯 애써 힘주어서 웃어주셨다.
"놀랬니? 이거 별거 아니다....으차!....끙!...."
엄마는 한번 힘주어서 일어나시려다 순간 아찔한 표정을 지은채 다시 주저앉으셨다.
"엄마!!!"
"이게 도대채 뭐야? 응?!!!"
나는 넘어지려는 엄마를 얼른 부축한채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별거 아니야, 조금 다쳤을 뿐이야..."
얼핏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모습인것을 알겠는데도 엄마는 내 심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시간이 갈수록 일부러 창백한 볼에 붉은 혈색이 돌아온것럼 기운을 차리려 하셨다.
반 년만에 집에 온 아들을 위해 손수 밥을 지어주시고 싶은 표정이
안타까움으로 바뀌는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나와 엄마는 몇 분을 일으켜라 무슨 일인지 알때까지 그렇게 못하겠다며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피우다 결국 엄마는 그 잠깐도 무척 힘드셨는지 조용하게 가쁜 숨을 몰아쉬시다
반쯤 일으킨 몸이 천천히 아래로 무너지셨다.
"아들 미안해. 오래간만에 온 아들한테...."
하시려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엄마는 금새 조용히 잠에 빠지셨다.
약간은 숨차고 약간은 엄마의 불규칙한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당황하고 놀랜 마음에
한동안 어쩔줄 몰라했다.
귀를 엄마의 가슴과 코에 갖다대며 확인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저녁이 되서야 내가 집에 오기 꼭 한달전에 엄마께서 크게 교통 사고를 당하셨다는 것을
간병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신 외할머니로부터 들을수 있었다.
"말도마라, 말도마, 헹여 너 공부하는데 정신 사납게 할거라고 절대 말하면 안된다고
어찌나 얘가 말리던지..."
할머니는 엄마의 그런 고집이 미우셨는지 슬쩍 눈을 엄마에게 흘기셨다.
"......"
나는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깊은 잠에 빠진 엄마의 숨소리와 리듬에 신경을 곤두세운채
얘기를 계속들었다.
"에휴 두번다시 생각하기 싫다!"
"나는 사고 나고 얘가 혼수 상태일때 '아, 이것이 나보다 먼저 가려나 보다' 그런 줄만 알았다 "
"......"
"...니 보고 싶어하더라..."
"......"
나는 애써 울컥 치미는 뭔가을 억누르며 아무말하지 않고 있었다.
"먼 길 왔으니 피곤할거다. 가서 일찍 자라. 낼부터 너도 바빠질거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안하시다 일찍 자라고 한마디 하셨다.
"......"
식구들 모두 하루동안 힘들었는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여 나는 아무말없이
내 방으로 돌아와 한참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리저리 뒤척이다 식구들이 잠들때쯤 몰래 엄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
엄아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 할머니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엄마의 손을 슬며시 잡아 보았다.
그 부드럽던 하얀 손이 한달새 이렇게 앙상해지다니...
헉! 하고 뭔가가 얼른 올라왔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목구멍에 힘을 줄수록 깊은 곳에서는 끄윽 끄윽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엄마는 그 깊은 잠에서도 주먹만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아들의 심정을 아셨는지
잡힌 손 슬쩍 힘 한번 주시고 예전 그 고르고 바른 숨소리로 위로하고 계셨다.
엄마!
나이 서른에 '엄마'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나는 '엄마'라는 고유 명사만 부르고 싶다.
어린 아기였던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기만 해주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엄마만 부르고 싶다.
엄마, 사랑해.
그러니까 얼른 나아.
아니 이젠 아프지마!
응?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