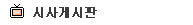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다리가 끊어졌다… 피란은 아비규환이었다"
어느 인문학자의 6·25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을 건너는 유일한 수단인 철교가 폭음과 함께 끊어졌다. 수많은 피란민들이 폭사하고, 국군 차량들이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쳤다. 퇴각하던 국군이 밀려오는 인민군의 진격을 저지하려고 서둘러 철교를 폭파해 일어난 참사였다.
강인숙(84) 건국대 명예교수는 그때 경기여고에 재학 중이던 열일곱 살 소녀였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피란길에 나섰다. 한강 철교가 멀리 보이는 강변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렀다. 짙은 어둠 때문에 철교는 보이지 않았다. 철교가 폭파된 것도 몰랐다. 그쪽을 응시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많은 차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철교 중간에 있는 어느 한 지점에 다다르면, 약속이나 한 듯이 헤드라이트들이 꺼져 버리는 것이다. 필름이 끊기듯이 깔끔하게 불들이 꺼져 버리고, 또 꺼져 버리고, 또 꺼져 버리고…그 남쪽에는 어둠만 있었다."
국군 차량들이 철교 폭파를 통지받지 못해 어둠을 뚫고 달려가다가 속속 추락한 것이다. 강인숙 교수는 지금도 67년 전 그날 밤의 비극을 생생히 기억한다.
문학평론가로 활동해 온 강 교수의 6·25 회상록은 서정적 묘사와 사실적 서사를 골고루 뒤섞었다. 소녀의 순수한 시점으로 본 전쟁의 풍속도가 마치 성장소설처럼 재현됐다. 소녀의 의식에 각인된 전쟁의 이미지는 '끓어오르는 간장과 된장'이었다. 포화에 불타는 마을을 지나칠 때 본 장독대의 옹기들이 잊히지 않는다는 것. "집들이 타면서 생긴 열로 장독대의 옹기들이 달아서 집집마다 장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독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장독들이 하늘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강인숙 가족은 한강을 건너지 못했다. 한강 철교가 폭파되자 군인들은 어렵사리 조각배를 모아 강을 건넜다. 그런데 그들은 강변에 남은 피란민들을 향해 조각배를 보내지 않은 채 남하했다. 다급해진 피란민 중 몇몇이 헤엄을 쳐서 조각배를 끌고 오더니 갑자기 선주(船主)가 됐다. 살겠다고 몰려드는 피란민들에게 엄청난 돈을 요구했다. 아비규환의 거래가 벌어졌다. 그래도 배에 매달리는 사람이 줄지 않았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배 한 척에 수십 명이 몰려들어 엎치락뒤치락했다. 배가 뒤집혀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 흩어진 가족이 울부짖기도 했다. 강인숙은 "군중의 욕심이 알몸을 드러낸 악몽 같은 장면이었다"고 회상했다.
=================================================================================
70년 만에 건립된 ‘한강 인도교 희생 위령비’
1950년 6월28일 새벽, 서울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피란길에 나선 서울 시민들은 깜깜한 어둠을 뚫고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 인도교로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6·25전쟁 무렵 한강에는 단선 철교 하나와 복선 철교 두 개, 그리고 한강 인도교와 광진교 등 다리가 모두 5개 있었다. 그중 인도교는 서울 시민이 도심에서 한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피란민 4000여 명과 피란 도구를 실은 소달구지, 군인 차가 뒤엉켜 한 발짝 떼기도 힘들던 새벽 2시30분 무렵, 천지를 흔드는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다. 인도교가 두 동강 나고 그 위에 있던 사람과 차들이 산산이 흩어지며 시커먼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이승만과 군 수뇌부가 북한군의 도강 위험 요소를 미리 없애겠다며 TNT 3600파운드로 인도교를 폭파한 것이다. 현장은 얼마나 참혹했을까. 그 목격담들이다.
“윤 중위와 같이 걸어서 폭파 현장까지 들어가 보니 북쪽 두 번째 아치가 끊겼는데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이었다. 그 많던 차량은 온데간데없고 파란 인의 불길이 반짝거리며 타오르는데, 일대는 피바다를 이루고 있고 그 위에 살점 등이 엉켜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피란민들이 손으로 다리 밑바닥을 박박 긁으며 죽기 전 본능인 듯 저마다 ‘어머니’를 외치고 있었다(국방부 정훈국 정훈과 이창록 소위 증언).”
“중앙청 앞을 지나 용산 한강 인도교에 이르는 동안 길 가득히 메운 민간 차량과 군용 차량은 흡사 홍수였다. 겨우 인도교를 지나 선두가 노량진 수원지 정문에 이르렀을 때 천지를 진동하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불기둥이 밤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시계를 보니 오전 2시32분, 단 2분이라는 시차로 우리 부대는 죽을 고비 하나를 넘었다(국군 16연대 부연대장 이원장의 증언).”
“미국 기자 3명은 한강 인도교가 폭파될 때 맨 앞에서 다리를 막 벗어나고 있었다. 뒤에는 4000명 이상의 피란민과 군인들이 다리 위에 있었다. (새벽) 2시30분경 오렌지빛 불이 캄캄한 하늘에 번쩍이고 땅이 뒤흔들렸다.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다리 남쪽 두 개의 긴 아치가 출렁대는 시커먼 물속으로 떨어졌다. 최소한 500명 내지 800명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고, 다리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폭파 전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사전경고도 없었다(〈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의 저자, 로이 애플먼).”
============================================================================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터지고 사흘 뒤 이뤄진 국군에 의한 한강인도교 폭파 희생자 수는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시 국방부는 사망자 대부분은 다리를 건너고 있던 경찰 77명뿐이라고 발표했지만, 평화재향군인회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가 펴낸 ‘한강인도교 폭파 증언록’들을 발췌한 자료와 폭파 당시를 목격한 미 군사고문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피난민 500~800명가량이 폭살되거나 한강에 빠져 익사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어둠 속에서 오렌지색 섬광이 번쩍였다. 한강대교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육군이 설치한 3600파운드의 TNT가 폭발한 것이다. 다리 위에 있던 피란민 수천명과 차량 수십대가 그대로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북쪽 두번째 아치를 끊었는데,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의 참상이었다. 피투성이가 돼 쓰러진 사람들이 손으로 다리 밑바닥을 긁으며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하지(下肢)를 잃고서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저서 '전쟁과 사회'를 통해 전한 목격자의 증언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와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를 참고하여 한국전쟁 당시 ‘한강교 폭파사건(한강 인도교 폭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공산군의 한강이남 진격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강다리를 폭파”할 때 “공병경계분대와 헌병대가 배치되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 내려오던 수십 대의 차량들이 대파되고 수많은 인파가 파편과 폭음 속에 사상(死傷)”을 입었다는 것이죠.
한겨레 <김봉규의 사람아 사람아/한강인도교 폭파는 학살의 시작이었다>(2022년 12월 7일 김봉규 기자)는 “한강 다리의 민간인 진입은 통제된 상태”로 “경찰 76명이 순직”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다는 조선일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당시 국방부는 사망자 대부분은 다리를 건너고 잇던 경찰 77명뿐이라고 발표”했지만 “평화재향군인회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가 펴낸 ‘한강인도교 폭파 증언록’들을 발췌한 자료와 폭파 당시를 목격한 미 군사고문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피난민 500~800명가량이 폭살되거나 한강에 빠져 익사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