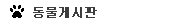누나는 개를 키우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이를 허하지 않았다.
궁여지책으로 누나는 홈플러스에서 햄스터를 사와선 멍멍이라 이름지었다.
처음 일주일간 멍멍이는 제 집 밖으로 나오지않았다.
난 누나가 햄스터 우리를 햄스터라고 부르며 키우는 줄 착각까지 했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을 보였지만 그때부턴 마치 야생의 동물처럼 철창과 플라스틱을 다 갉아대기 시작했다.
그런 멍멍이를 손으로 만지기까지는 꽤 걸렸던걸로 기억한다.
밀웜과 해바라기씨로 유인하면서 포동포동한 궁딩이를 구경하곤 했다.
친구들에게 '멍멍이'라 이름지여진 계기를 설명하면서 웃고는, 알게모르게 햄스터 사진자랑도 종종했다.
그렇게 멍멍이와 우리 가족이 같이 지낸게 벌써 2년 3개월 가량이다.
몇 주전부터 멍멍이는 많이 쇠약해보였다.
한쪽 눈에는 다래끼같은게 나서 약을 발라도 잘 낫지를 않았으며, 내가 손을 갖다대면 혀로 핥핥해주던 녀석이 다시금 세게 물기 시작했다.
누나 말로는 턱쪽에 혹같은게 있다고도 했다.
그냥 나이가 나이인만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그러다 어제저녁에 녀석이 유난히 신나보였다.
평소엔 잠을 잘 시간인 초저녁에 나와서는 솜뭉치를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땅을 파고 그랬다.
다소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을 본것같아서 덩달아 나까지 기분이 좋았다.
손을 갖다대니 핥핥하려는 척하면서 또 세게 물 시동을 거는게 아닌가?
과도한 핸들링은 햄스터한테 좋지않다는걸 알기에, 그리고 나도 손을 물리면 아프기에 얼른 손을 삐고 놀라고 내비둔 후 나는 잤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 멍멍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뜨고 꿈쩍도 안하고, 만져도 반응이 없는 모습에 난 순간 녀석이 죽은 줄 알았다.
당황해서 누나를 불러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미세하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평소의 빠른 숨패턴이 아닌, 천천히.. 천천히 헐떡이고 있었다.
때가 온것임을 직감했기에,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있게 해주려고 급수기 받침대를 치웠다.
급수기 받침대에 턱을 괴고 엎드려 있던 멍멍이의 상체가 같이 움직인다.
밤새 침을 흘린게 털과 받침대에 묻은게 굳은게 아닌가 한다..
간신히 떼어내고 누나는 마저 돌보며, 나는 출근을 했다.
출근하기 전에 멍멍이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인사를 했다.
왜 인지 모르지만 멍멍이는 울고있었다.
햄스터도 눈물을 흘린다는건 처음 알았고 처음 봤다.
아파서 우는건지 세상을 떠나는게 아쉬워서 우는건지 우리를 못보는걸 예감해서 우는건지는 잘 모르겠다.
어제부로 입사한 신입사원인 부리나케 회사로 갈수밖에 없었다.
버스타러 가는 아침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게 느껴졌다.
회사에서도 이러면 안된다는 걸 알기에, 일부러 멍멍이 생각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멀쩡히 인사하고 얘기하고 업무보고 밥을 먹었다.
웃고 떠들고 집중하고.. 그러다 문득문득 멍멍이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점심시간에 누나에게 멍멍이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니
사진이 날라왔다.
휴지 위에 해바라기씨가 몇개 있더라.
난 그 의미를 잘 몰랐다.
퇴근 후에 집에 와보니 휴지안에는 멍멍이가 있고 그 위에 해바라기씨가 있는 것이였다.
내일 공장에 있는 마당에 묻어줄 예정이란다.
비록 큰 탈없이 수명을 다하여 죽는 멍멍이지만, 세상에 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며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다.
집에와서 그 모습을 보고 참았던 눈물이 터지는걸 막을 수가 없다.
도저히 어쩌지 못해서 울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글이 멍멍이한테 바치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
멍멍이는.. 좋은 곳에 갔을 것이라 믿는다. 착한 녀석은 아니였지만, 그 녀석으로 인해 마음에 힐링을 많이 받았다.
혹시라도 다음 생에 만나게되면 같이 소주한잔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