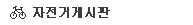와룡 소학교 전경.
나는 사실 이곳에 도착해서 스스로의 감정에 사로잡혀 많은 상상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내다 휴일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이 학교, 이 마을 출신 아가씨를 운명적으로 만나 결혼을 하고 정착을 한다'는...
그치만 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하루 묵어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길을 나섰다.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의 일상에 내가 불쑥 끼어들 무엇도 없는거다.
학교가 길에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다. 작은 학교에 적은 학생들. 더 정감이 간다. 이 학교도 한국의 많은 분교들 처럼 곧 문을 닫겠지..
동네 시냇물도 정겹고.. 물고기 좀 있어 보인다. 물고기 잡아서 청양고추 넣고 깻잎 넣고 매운탕 끓여서 친구들과 시원한 막걸리 한잔 했으면...
밤에 깔끔떠는 처녀 귀신 보다는 털털한 도깨비 나와 신명나게 한판 놀고 갈 듯한 집도 보이고..
마을에 들어올때 그런것 처럼 마을을 빠져 나가는 길도 내 마음을 흔든다.
비포장 도로가 나오더니 1시간 정도 이어졌다. 차들이 지나가면 밀가루 같은 흙먼지가 날아 올랐다. 그러면 크게 숨을 들이 쉬고 빨리 지나가
보지만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숨을 참기는 어렵다. 아.. 삼겹살 먹고 싶다.
비포장 도로를 지나 조금 더 달리니 연변으로 가는 큰 도로에 들어섰다. 이제 몇시간만 더 가면 연변이다. 그동안 한반도의 북쪽 끝 정도의 높이인,
그나마 많이 들어보고 친숙하여 가보고자 했던 연변. 스마트폰 지도로 대충 따져보니 오후 3시나 4시정도 도착해서 일찍 쉴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큰 도로 옆으로 넓게 펼쳐진 논밭들도 보이고 좀 더 가다보니 모범적으로 일을 잘해서 부촌이 되었다는, 일종의 '모법 농촌마을' 간판도 보였다.
근데.. 날씨가 많이 덥다.
이 쪽에 조선족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지나온 다른 곳과 다르게 묘지도 한국의 묘지와 비슷하게 조성되어 있다.
자매 뀀점. 간판 중에 한글이 같이 되어 있는 간판 중에 '뀀점'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꽤 많이 보인다. 꼬치구이 집이다. 지나가면서
보면 저렇게 가게 앞에 불피워 꼬치 구울수 있는 도구들이 보인다.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저렇게 요금을 받고 있다. 지나온 몇 도시들도 그랬고..
뭐 잘해 보자는 구호 같은데.. 여기 사람들은 저걸 보고 뜻을 알기에 저렇게 써 놓은 걸까? 그리고 좋은 구호라도 자꾸 외치다 보면 질린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2시간 정도 더 가니 연변 가기 전, 연변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 용정에 도착했다. 날씨도 너무 덥고 길도 물어 볼려고 슈퍼에 들러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사면서 아주머니에게 연변 가는 길을 물으니 가던 길로 계속 가라는 제스추어를 하신다.
제법 큰 도시인 연변가는 도로가 좀 작은게 이상했지만 좀더 가고 있는데 앞쪽에서 MTB에 자전거 의류와 헬멧, 고글까지 쓴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말 잘하는 아저씨가 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번 더 확인차 연변 가는 길이 맞냐고 하니 맞다고 한다. 2시간 정도 가면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언덕이 많은 길을 부지런히 가다 보니 오른쪽으로 깔끔한 한옥이 눈에 띄였다.
윤동주 생가. 명동촌.
내 무식은 윤동주 시인을 소설가 춘원 이광수와 혼동하고 있었다. 집에 춘원의 '무정'이라는 소설책이 있었는데 좀 읽다가 재미 없어 덮어 놓았던..
그리고 김동인의 '감자'라는 소설도 윤동주 시인이 쓴 줄 알고 생각이 믹스되어 '예전 이곳 시골 배경이 소설의 배경이 되었을 법 하군' 하며
도로에서 사진만 찍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리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는 이곳에 들러 윤동주 시인의 흔적을 찾아 보지 않은 것을
많이 후회 했다.
윤동주 시인은 이런 시를 쓴 사람이었다.
별헤는 밤
- 윤 동 주 -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어쨋든,
나는 열심이 2시간 30분 정도를 계속 갔다. 오르막은 끌바도 하고.. 덥기도 더워서 끌바를 하다가 일부러 도로에 검은 타르 덩어리를 비틀어 꾹
밟아보니 껌처럼 신발에 들러 붙는다. 그리곤 걸을때 마다 신발이 도로에 달라 붙는다. 터벅 찌끄덕, 터벅 찌끄덕, 터벅 찌끄덕.. 생각해 보면 좀
웃기는 상황.
근데 가면서 스마트폰 지도를 봐도 연변쪽이 아닌 북한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차도 별로 안 다니고 2시간이면 간다고 했는데 벌써 한참 더 온거 같고
뭔가 이상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경사를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차를 손을 흔들어 세워 물어보니 이길이 아니라고.. 다시 용정으로 가서 가야한다고..
으.. 이런 ㅆㅂ 아니 슈퍼 아줌마는 말이 안통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저씨는 왜 잘못된 길을 알려 준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그런거
갔다는 생각에 분노가 솟았다. 바로 다시 용정으로 페달을 열나게 밟았다. 전반적인 내리막에 길을 잘못 알려준 아저씨 욕을하며 분노의
페달질로 2시간 30분 거렸던 길을 거의 1시간 만에 돌아와 아까 들렀던 가게에 들어가 또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사서 먹었다. 근데 아까 그 아줌마는
안보이고 다른 아저씨가 있었다. 3시간 반을 힘만 빼고 소비해 버렸다. 연변 갔으면 벌써 가서 쉬고 있을 시간. 나는 이번 일로 앞으로는
지도를 기본으로 믿고 사람들에게 재차 재차 확인하기로 굳은 결심을 했다. 이게 뭔 개고생인가?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연변 가는 길을 물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여기가 연변이라느니 하며 날 이곳 용정에서 못 벗어나게 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슈퍼 아줌마와 MTB 아저씨 처럼.. 용정에서 한문으로 우물 정(井)자 처럼 우물에 빠진 느낌.
그러다 만난 한국말을 할 줄 아시는 아저씨가 설명한 대로 가니 큰 대로가 나왔고 또 긴 오르막을 낑낑대며 2시간 가니 드디어 연변 시내가 보였다.
으.. 드디어 왔도다 연변. 이미 몸은 많이 지쳐있는 상황. 시간도 많이 늦었고..
잽싸게 내리막을 내려가 적당한 숙소를 찾아 한참을 헤메는데 도시가 꽤 크고 시내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엄청 많아 자전거 타고
차들, 사람들 사이 빠져 나가느라 또 진땀 뺏다. 2시간 정도 헤메다 어두워질 즈음 50위엔(9,000원 정도) 하는 한 려관에 짐을 풀었다.
려관에서 씻고 나와 이번에는 저녁 먹을 곳을 찾아 헤멘다. 큰 도시에 어울리지 않은 당나귀 달구지.
깔끔한 면 전문점에 들어가 시킨 면. 매장 바깥쪽에 메뉴들이 사진으로 붙어 있고 들어가니 메뉴도 사진으로 되어 있어 주문하기 편했다.
자전거 타면 계속 아팠던 엉덩이도 한번 만저보니 우둘두둘하게 습진 같은게 나 있었다. 애매한 위치라 볼 수는 없었지만
매일 장시간 자전거를 타니 좀 짖무른 것 같았다. 엉덩이도 피부약 발라주고.. 나는 엉덩이 아픈게 자전거 오랫만에 타면
아픈 것처럼 근육 문제인줄 알았는데 피부 문제였던 것이다. 빨리 굳은살 배기듯 피부가 단단해 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