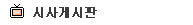2030년 중국,미국의 명목 GDP 추월
中 인터넷기업들 '디지털 G1' 주도
거대한 대륙, 단일시장으로 묶어내
▲중국이 이긴다
| | |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죽기살기로 붙었던 무역전쟁의 휴전을 선언한 거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소엔 각자 다른 속내가 비친다. 선방은 18일 중국에서 나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 정유신의 주장대로 “장기전으로 들어서면 어차피 미국을 이기게 될 테니까”로 읽히기도 한다. |
|
‘90일 휴전.’ 이것은 분명히 전쟁이다. 총·칼 대신 콩·자동차 따위를 들었을 뿐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여름·가을을 보복전으로 치고받으며 보냈다. 세 차례에 걸쳐 미국은 2500억달러(약 282조 5000억원)어치의 중국산 제품, 중국은 11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때렸다’. ‘무역전쟁’이란 타이틀 아래 죽기살기로 붙은 ‘한판’이었던 거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전쟁이 극적인 정전협정을 이끌어낸 것은 이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각자 다른 속내의 웃음을 흘리며 손을 맞잡은 거다. 두 사람이 각자 집으로 돌아간 뒤 머리를 싸매고 내놓은 휴전선물은 이것. ‘미국은 내년 1월부터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쏟아부으려던 25% 추과관세 계획을 3월 2일로 미룬다.’ ‘중국은 211개 품목의 미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석 달간 중단한다.’
이쯤 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조바심 내던 주변국들이 마음을 좀 놔도 되는 건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보인다. 어차피 이 싸움은 승패를 내야 할 것 같단 말이다. 왜? 단순히 무역적자를 해결하자고 덤벼드는 정도가 아닌 듯하니까. 본질적으로 미·중 간 경제패권 쟁탈전이니까.
지난 7월 먼저 선전포고를 날렸던 미국의 사정이 그렇다. 관세폭탄을 투하한 1300개 중국산 수입품목을 보니 단순치가 않더란다. 통신설비·항공기·선박·전기차·산업용로봇 등, 경제로 세상을 다시 평정하겠다고 꺼낸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전략산업과 완전 일치한다. 한마디로 싹을 눌러버리자는 전략이었던 거다. 상황이 이러니 석 달씩 전쟁 유예기간을 마련한 휴전은 말이 휴전이지, 전의를 가다듬기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겠느냐는 거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토록 긴장할 만큼 중국이 절대 유리한 판인가. 아니면 미국이 종내 1인자 자리에 단단히 못질을 하게 될 건가.
국내를 대표하는 중국전문가인 저자가 잠정 결론을 냈다. 중국은 마침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다만 조건이 있다. 시간을 끌어야 한단다. 단기적 공세를 견뎌내고 ‘장기전’으로 돌아서면 중국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진다는 거다.
△2030년 중국, 미국의 명목 GDP 추월
“시간은 중국 편!” 저자의 이 자신감은 뭔가. 우선 양적 가능성을 꼽는다. 201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조 달러 증가한 12조 5000억달러라는데. 이는 세계 1위 미국의 63%, 3위인 일본의 2.5배, 11위인 한국의 12.6배나 된단다. 지난 5년간의 이런 추세로 중국이 6.5%, 미국이 2%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12년 후인 2030년 드디어 중국은 미국의 명목 GDP를 추월하게 된다.
그렇다면 질적으로는? 이것은 토 달 필요 없이 중국이 미국을 가뿐하게 추월할 영역이라는데. 바로 ‘디지털 G1 전략’ 때문이다.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화로 거대한 대륙을 단일시장으로 묶어낼 정도니. 정부가 나서서 달리는 ‘인터넷플러스’ 전략, 특히 디지털을 대변한다는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의 성장속도는 언감생심 따라잡을 수가 없다. 연평균 62%씩 뛰어오르는 중이다. 빅데이터는 또 어떤가. 인구수로 미국의 5배인 중국인이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결제에 뛰어들었다. 이는 숫자 데이터 외에 텍스트 문자정보, 카메라 영상정보 등을 알아서 양산한단 뜻이다.
△판 뒤집는 건 ‘시장’…결국 중국이 유리해
책은 판도를 단숨에 중국 쪽으로 돌려버린다. 이제껏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단 주장은 두 주류였다. 과잉투자로 인한 기업부채 해소가 단기간에 안 될 거란 것, 세계패권을 쥐는 데 필요한 언어·통화를 중국이 장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 게다가 ‘경제수치만 늘린다고 패권이 따라오느냐’면 대답이 궁했다. 여전히 중국은 경제규모도 그렇고 첨단기술·군사력·문화·정치 등 어느 하나도 미국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예전 미국이 영국을 추월하던 때를 떠올려보라고 한다. 판을 뒤집어낸 가장 큰 동력은 기술이 아닌 시장이었다는 거다. 중국은 이미 미래 주력산업인 자동차·로봇·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대시장이 됐으니까.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호재로 불을 당기는 중이니까. 시장크기, 투자액, 변화속도가 가히 압도적이다.
사실 중국을 주도하는 리더그룹은 따로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탄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등. 이들이야말로 세계의 공장, 짝퉁의 집산지였던 중국을 뒤바꾼 1등 공신이라고 치켜세운다. 알리바바가 주도해 올해 10주년을 맞은 ‘광군제 할인판매’로 하루 34조원의 매출을 찍는다는 게 쉬운 일이냐는 거다.
중국 인터넷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치열한 경쟁을 꼽았다. 가령 P2P 대출업체. 미국은 최대 100곳을 넘긴 적이 없지만 중국은 2000∼3000개가 태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중이다. 벤처투자? 2016년 402억달러로 한국보다 22배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경쟁률이 1501대 1. 한국의 278대 1은 명함도 못 내밀 판이다. 그 경쟁을 뚫고 살아남았으니 단단하고 강력할 수밖에.
△한국, 승리한 중국과 관계 다시 잡아라
사실 저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중국이냐 미국이냐’보다 한국의 대응전략에 있는 듯하다. 과연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올라섰을 때 한국은 뭘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아남았다는 소리를 들을 건가 말이다. 중국에 물건을 많이 내다 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다. 당장은 ‘관계 변화’란다. 수출에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일단 중국자본 유치를 조언한다. 중국시장 공략에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화장품이니 엔터테인먼트니 중국이 혹하는 영역을 선두로 말이다. 물론 기술유출의 위험은 있다.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다. 기술을 빼앗길까 봐 우려하는 사이 더 중요한 시장을 빼앗길 판이라고.
새로운 얘깃거리보단 지금까지 진행해온 미·중 경제패권전의 정리판으로 보인다. 방점은 당연히 중국에 찍었고 그 끝에 중국이 ‘디지털 G1’이 되는 단계를 수순처럼 박았다. 때마침 18일 시진핑 국가수석이 휴전 중 선방을 날렸다. ‘중국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발언. “중국의 발전은 어떤 국가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역설적이지만 저자의 주장대로 “장기전으로 들어서면 중국이 어차피 미국을 이기게 될 테니까”로 읽히기도 한다. 어떤가. 속이 답답한 건 트럼프일 텐데, 속이 터져나가는 건 한국이 된 듯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