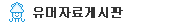벨로루시 공화국 수도 민스크에서 북동쪽으로 8㎞ 떨어진 쿠로파티 마을. 마을 외곽의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면 유쾌하지 못한 정적이 엄습해 온다. 이곳은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된 현장이기 때문이다.
스탈린의 공포정치 시절인 1937년부터 41년에 걸쳐 4년반 동안 소련의 NKVD(비밀경찰)는 날마다 사람들을 트럭에 실어와 총살했다. 마을사람들은 총성과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 신이여’ ‘왜?’ ‘허무하다’ ‘어떻게든 구해줘’ 등 비명소리…. 농민과 지식인, 사제, 러시아정교·가톨릭 신자들이 살해됐다. 비밀경찰은 할당된 숫자를 채울 필요가 있을 때는 보통사람들도 죽였다. 그들은 이곳에서만 약 25만명의 생사람을 죽였다.
이런 사실은 50년의 세월이 흐른 88년까지 철저히 은폐되었다. 그러나 벨로루시의 고고학자 포즈냐크 등 스탈린 공포정치의 죄상을 파헤쳐온 활동가들에 의해 서서히 진상이 드러났다. 쿠로파티의 숲에서 무수한 인골들이 발굴되었다. 칫솔, 안경, 여성의 머리카락 등과 닭뼈까지 나왔다. 닭고기를 먹고 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살해된 것이다.
물론 이 진상규명 작업에는 80년대 중반 시작된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이 뒷받침을 했다. 고르바초프는 스탈린주의와 스탈린주의적 제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자 했던 것이다.
민스크외곽서 25만 학살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의 뒷산. 이곳은 우리 역사의 학살현장이다. 한국전쟁 당시인 51년 2월(또는 3월) 이불과 옷가지, 솥단지 등 가재도구를 든 민간인들이 11대의 군용트럭에 실려와 이 골짜기에서 군인들에게 학살당했다. 2000년에야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발굴작업이 이뤄져 6개의 구덩이 가운데 한곳을 파헤친 결과 250구의 유골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집단학살된 민간인들의 유골이란 것뿐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유족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죽음, 고통스런 진실을 그냥 묻어둘 수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명료하다. 지리산 지역에서 생명평화 탁발순례를 하고 있는 도법·수경스님 일행은 지난달 하순 이곳을 찾아 위령제를 지냈다. 도법스님은 “동족상잔 비극의 현장에 우리는 섰다. 비극과 상처의 원인을 찾아내고 과오에 대한 진실된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는 ‘한국전쟁 휴전 이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에 관한 통합특별법안’을 부결시켰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보상의 길이 막혔다. 정부가 거창사건 특별법안을 거부한 이유는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다른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보수단체의 반발이었다.
국회에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안’은 부결되고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거창사건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에서 보듯 현재 여러 갈래로 제기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접근은 다분히 이익추구적이고 안이하다. 이를테면 생명·평화정신에 입각한 반성과 참회의 철학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돈문제는 그 다음에 따질 일이다.
외면 한다고 사라지나고통스런 과거의 진실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에 눈감는 사람은 현재에도 눈멀게 된다”는 말은 항상 진리로 다가온다.
오늘날 러시아에는 아직도 스탈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않다. 소련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탈린의 강력한 지도력 덕분이었다는 식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고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인물로만 기억하는 사고구조도 스탈린 향수의 한국적 버전이다. 모두가 과거의 거짓을 안이하게 바라본 결과이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