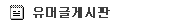악을 쓰고 통곡하고 울다 지쳐 실신하고, 삭발투혼이니 감량투혼이니 무슨 무슨 투혼을 발휘하면 연기를 잘 하는 것인가? 도대체 한국에서 연기를 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방송사들의 연말 시상식을 보면서 몇 번이고 든 생각이다.
동네 잔치하듯 자기 방송사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을 모아다 놓고 상을 수십 개씩 남발하는 것, 그래서 연기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기 방송사에 출연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앞으로도 잘 해 보자는 취지의 친목상이라는 등 그런 것들은 익히들 아는 이야기다. 그런 문제들을 제쳐 두고라도, 과연 연기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좋은 드라마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연말의 행사들은 한번쯤 생각해 보게 만든다.
상을 뿌려대긴 했지만, 그래도 받을만한 사람들이 상을 받았다는 여론을 얻은 한국방송의 연기대상 시상식을 보면서, 후보로 오른 연기자들의 열연하는 드라마 장면들이 연속으로 쏟아질 때마다 정말이지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다. 울고 울고 또 울고, 울다 지쳐 실신하고 드러눕고 악쓰고. 심지어는 그런 종류의 연기가 캐릭터의 핵심이 아니라, 좀 더 섬세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사한 연기자들을 보여 줄 때도 그런 장면들만 모아서 편집을 해놓았으니 더했다.
정도가 이러니 예전 에스비에스의 <그 여름의 태풍>이라는 드라마에서, 연기자의 자질을 알아본다면서 과연 몇 초 안에 울 수 있는지 초 단위로 재는 장면이 나왔던 모양이다. 연기자는 마구 슬픈 생각들을 쥐어짜 내며 울고, 감독은 시간을 재고 있다가 1분이 안 걸렸다며 ‘됐어! 좋아!’ 이런 식이다. 이제 시청자보다 연기자가 더 많이 울어서, 디테일이나 내면적 정서는 무시하고 가도 오히려 열연이고 투혼이라며 대접받는 풍조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연기뿐 아니라 드라마가 흘러가는 방향만 보아도 그렇다. 한국 드라마는 오로지 울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가? 오열하고 통곡하지 않아도, 가슴을 저미는 장면들이 있다. 자신의 아픔은 가슴 깊이 묻어두고, 아닌 척 삼키고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을 버린 아비를 만나 참지 못해 굵은 눈물 한 줄기를 흘리면서도 꼿꼿하게, “이것이 어찌 비단 나만의 고통이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자의 아픔은 얼마나 큰 것인가? 혼자 길을 걸으며, “슬프지 않은 셈 치고…. 억울하지 않은 셈 치고…. 선생님 돌아가시지 않은 셈 치고…”라고 중얼거리는 여자의 심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악쓰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도, 이렇게 담담한 척하지만 실은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실어 시청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심리적 연기, 내면적 연기가 과연 통곡하고 오열하는 연기보다 쉬운 것인가? 적어도 방송사가 1년을 마감하며 연기자들에게 상을 주려면, 눈에 뻔히 다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끄집어내 평가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06년 한국 드라마계는 좀 더, 그런 순간들을 소중히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
박현정/드라마몹 에디터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