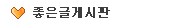나는 그때 한 소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왔는데 그녀는
논둑 사이에서 내게 속삭이며 말을 했다.
"난 널 사랑하고 있지 않아. 난 네가 싫어. 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단 한 사람뿐이야."
그녀는 누렇게 익은 벼 사이에 서 있는 허수아비를 가리켰다.
"난 그와 결혼하겠어. 난 그의 아이를 낳을 거야."
가을의 들판에는 무수한 허수아비들이 서 있었다. 그것들은 낡은 농모를 쓰고 밀
짚의 심장을 가지고 들판에 우뚝 서 있었다. 참새떼들은 아무도 그를 무서워하
지 않았다. 나는 왜 그녀가 허수아비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혼자 벼밭 사이로 들어가 허수아비처럼 팔을 벌리고 몇날 며칠을 서보기
도 했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우거진 벼 사이에서 그 소녀가 한 남자와 옷을
벗고 딩구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허수아비의 아이를 배지 않았으며 그 남자의
아이를 배었다.
그녀는 거짓말장이였다.
"나 임신했어."
그녀는 조금 울먹거리기도 했었을듯 싶다.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고,
어조는 다급했다. 그녀는 마치 내게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듯 그렇게
말하였다.
나 임신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담배를 문 내 입은 천천히 열렸다.
"그래서?"
이 말과 함께 그녀의 눈에 아롱아롱한 큰 눈망울이 맺히더니
곧이어 뚝뚝, 비처럼 쏟아내리기 시작했다. 가랑비인가, 소나기인가
하고 의미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때 그녀가 내게 다시 말했다.
"병원에 같이 가줘."
나는 무슨말을 해야 됄지, 고민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왜?"
오랜 침묵을 깨고 내가 한 말이었다. 그녀는 카페안의 점원에게
티슈를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눈물을 닦았다. 다가온 점원은
무테 안경을 반짝거리며 나를 보고 잇었는데 그것은 마치
흡사, 짐승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병원에 같이 가줘."
"누구 애야?"
"잘 모르겠어." 하고 그녀는 말 끝을 흐렸다.
그녀가 나를 찾아온것은 6개월만이었다. 그래. 고작 낙태수술에
동행할 남자를 찾기 위해서 그녀는 내게 다시 돌아온 것이다.
"돈은 있고?"
"응."
"몇개월 인데?"
"4개월."
"애 아빠는 누군데?"
"모르겠어."
모르겠다니.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다. 그만큼 수많은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로 모른다는 말인가.
그녀는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 2개월 정도 전에..."
오토바이사고로 죽은 남자의 씨를 자궁에 잉태해온 여자
그 잉태된 태아를 죽이려는 남자와 여자가 커피 두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가자."
나는 가방을 들쳐메며 말했다. 그녀는 티슈를 주머니에 챙겨놓고
나를 따라서 일어섰다. 나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을 찔러왔다. 잔혹하리만큼 아프게.
나는 큰 병원에 가기로 했다. 낙태라도 그것은 엄연한 출산이니까
낙태에도 산후조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중학교 3학년때 낙태를 하고
2시간 후에 술을 질펀하게 마셔대던 어떤 계집애는 한달도 채 안돼 머리가
숭숭 빠져 버렸다. 야위어 가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하혈을 하기
시작했으며 눈밑은 거매졌다.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다.
순간이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자궁속의 아이는 그렇게 청소기의 흡입기로 분해되어 빨려들어갔다.
비닐봉지로 쌓여서, 쓰레기통에나 버려질 인생. 차라리 잘 되었다.
축복받지 못할 인생이라면, 아픔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의무로
죽여줘야 할 것을, 아이는 축복의 죽음을 강요당한 행운이라도 가졌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래도 이름은 지어 줘야지."
"이름은 왜. 어짜피 죽은 새낀데."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지어 줘야지. 귀찮으면 아무렇게나 짓던가."
"민석이라고 지을래."
"씨팔, 재수없게 남의 이름은 왜 갖다 대."
"니 이름이 좋아."
그녀는 계속 울었다. 나는 그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그녀를 계속 달래 주었지만 그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죽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죽일수
밖에 없었던 자신이 슬펐을 것이다.
그녀는 두어시간 자고 일어나더니 밥을 짓기 시작했다.
두부를 자르고 참치캔을 꺼내고 김치를 다듬어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먹었다. 그녀는 몇숟갈을 떠 먹다 말고 눈물을 흘리더니
곧이어 화장실로 들어가 다 토해 버렸다. 나는 그녀의 등을 두둘기며
같이 울었다. 우리는 울었다.
나는 그녀의 집앞 슈퍼에 들려 소주를 한병 사왔다.
알코올의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들어왔지만 이런 날에는 술의 힘이라도
기대야 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미쳐갈테니까.
그녀는 몸을 긁어댔다. 온 몸을 긁어대더니 결국에는 목욕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힘이 없었다.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했으며 다리와 팔은 벌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뜨거운물을 데운후에 그녀의 옷을 모두 벗겼다.
그리고 그녀를 안아서 욕조에 눕혔다. 나또한 옷을 다 벗었다.
그렇게 나는 그녀를 씻겨 주었다. 머리를 감겨 주고 그녀가 추울까봐
뜨거운물을 더 틀었다. 그리고 비누칠을 해 그녀의 온몸을 씻겨 주었다.
그녀는 내 성기를 만지작거렷다. 나는 흥분돼지 않았다. 그녀의 여린
팔목을 씻겨주다, 나는 울었다. 그리고 아주 한참을 울었다.
그녀가 나를 안아 주었고 나는 울면서 그녀를 씻겼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생물으로써의 죽음이 아닌
사람으로써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안쓰러워졌다. 나는 그녀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고백했다. 너의 연인이 되어
주겠노라고. 나는 임종을 앞둔 한 주검에게 말하듯이 경건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너의 곁에 있어주겠노라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곧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집으로 왔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나는 그녀의 집으로 이사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
<titleooo>멋있는 글..</titleooo>
<bgsoundooo src=http://munghoney.com.ne.kr/음악파일/poems.as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