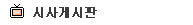영화 <1987>을 관람한 뒤 1987년과 2017년이 만나는 접점을 생각했다. 그 중 하나가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승리다.
이 승리는 ‘서사의 힘’, ‘스토리텔링’에 힘입은 바가 커 보인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다수는 ‘1987년 시민혁명’의 경험과 ‘2017년 촛불혁명’의 경험을 동일시하며 정권 교체의 열망을 정치적 실행으로 발화시켰다.
여기에 국민 다수에게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억마저 문재인 후보의 ‘서사’에 더해졌다.
다른 후보들로는 이 ‘서사’를 뒤쫓을 아무런 스토리텔링도 갖추지 못했다.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던 “모래시계 검사”라는 ‘서사’는 근거도 충분치 않았고, 국정농단 적폐의 책임이 큰 새누리당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서사’의 소재가 아니었다.
안철수 후보는 본인 설명대로 1987년에 의대 대학원생이었을 뿐이고 새 정치 주창은 ‘서사’의 힘을 갖지는 못했다.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비서 출신이니 서사를 거론할 필요도 없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서사’는 계속 힘을 더해갔다. 대학생·인권변호사로서 민주화운동 전력,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정치인으로서의 재기,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훈남 이미지, 거기에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서사’에 힘을 더한다.
이것이 국정 수행 지지도와 ‘문파’라는 지지층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널리스트로서 ‘우리의 서사’와 ‘서사에 도전하는 우리’이다.
이런 문재인 서사에 비판적으로 도전해 국정과 권력을 감시할 우리는 어떤 ‘서사’를 갖고 있는가? 80년대 군부 세력에게 굴종한 과거, YS·DJ 장학생으로 불리던 90년대, 금권과 사주의 힘에 눌린 2000년대, 질문금지 기자회견으로 얼룩진 2010년대….
자꾸만 거대해지는 문재인 정권의 ‘서사’에 우리는 맞설만한 아무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도 긍정적 ‘서사’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데 우리는 쌓아놓은 것이 없다.
오히려 계속되는 오보와 선정적인 제목으로 지지자들의 분노를 사기만 했다.
우리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으로 이런 저런 비난을 들었다.
그것도 ‘서사’의 프레임에서 살피자면 참패였다.
이미 청와대는 이전 정권과 전혀 다르게 자유로운 질문, 정해진 몇몇이 아닌 대통령이 질문기자 직접 지목, 모든 국정분야에 대한 대통령 즉석 답변 및 수석들의 추가 설명, 1시간 이상으로 대폭 확대 등 획기적인 서사의 틀로 기자들을 압박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기대하는 ‘신년’ 기자회견 틀을 짰는데 기자들은 이런 ‘서사의 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질문의 수준은 흡족스럽지 못했고, 연초에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신해 따질 것이 아니라 춘추관 관장한테나 투정할 지엽적 문제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하기보다 회사의 상관들이 보시기에 흡족해 할 질문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었다.
영화 <1987>은 우리 저널리즘에 대해 국민들이 조금 더 지켜보며 기다려 줄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성실함과 진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권력에 도전하고 권력을 넘어서는 저널리즘을 이루도록 성찰하고 노력해 나가자.
오늘 우리가 저널리스트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분투가 언제고 <2017>, <적폐청산 2018>…. 이런 제목을 내건 영화의 자랑스러운 서사로 남아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관람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변상욱 CBS 대기자
이 글이 매우 불편한 한국일보 대기자 서화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