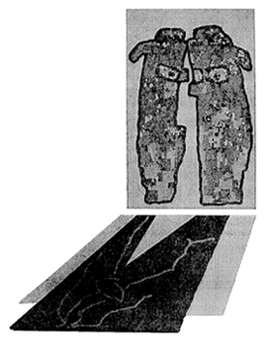'역사를' 배우기보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단종의 유배지 청령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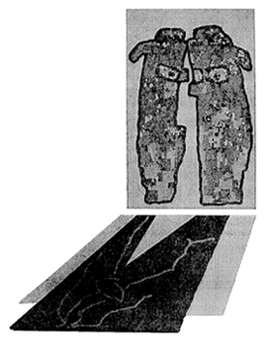
당신은 유적지를 돌아볼 때마다 사멸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들의 심금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로이 읽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라고 하였습니다. ‘과거’를 읽기보다 ‘현재’를 읽어야 하며 ‘역사’를 배우기보다 ‘역사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는 강과 산이 절묘하게 조화된 이른바 산수대우(山水大友)의 땅입니다. 남한강 상류의 맑은 물이 유유히 흘러오다 갑지기 물길을 돌려 뼘을 그린듯 동그랗게 남겨놓은 솔숲과 백사장이 그림같습니다. 산과 강이 서로를 아끼며 벗하는 자연의 우정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은 산수의 아름다움보다 단종(端宗)의 유배와 죽음을 먼저 봅니다. 어린 유배자가 시름을 달래던 소나무가 500년 풍상에 늙어 있고 그리움을 연으로 띄우던 노산대(魯山臺)에는 지금도 단종의 한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단종의 유배지로 택한 이유는 물론 삼면이 강으로 에둘려 있고 나머지 한 쪽은 험준한 절벽이어서 마치 외딴 섬처럼 완벽하게 고립된 땅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강물속에 와류(渦流)와 냉수대(冷水帶)가 숨어 있는 음기(陰氣)의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음지(陰地)를 유배지로 고른 그들의 냉혹함이 섬뜩합니다.
자연을 사람을 살리는 데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에 이용하는 지식인의 비정한 과학이 두렵습니다. 단종비(端宗妃)를 자기집의 노비로 내려주기를 청탁하던 대신들의 몰인정한 이야기까지 회상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싸늘하게 합니다.
어릴 때의 충격은 깊이 각인되는 것인지 내가 단종의 나이 때에 읽었던 소설 『단종애사』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단종의 모습은 그 소설속에 있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금부도사가 사약을 가지고 내려 왔을 때 마침 단종이 집에 없었습니다.
어린 독자였던 나는 단종이 집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얼마나 마음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녁 어스름에 공생(貢生) 복득(福得)이 활 시위로 목을 졸라 죽인 단종의 시체를 끌고 오고야 맙니다.
단종은 국왕이란 칭호가 어울리지 않는 어린이입니다. 상왕(上王)이란 칭호는 더욱 그렇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만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고아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린이를 왕좌에 앉히고, 끌어내리고, 다시 복위(復位)를 도모하고, 유배와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세조의 왕권찬탈은 흔히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되고 단종복위를 모의하다 주륙당한 집현전 학사들은 선왕의 고명(顧命)을 받든 충절의 사람들로서 추모됩니다.
그러나 세조의 주변에 결집한 세력의 사회적 성격은 무엇이며 그처럼 살벌한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기어이 복위를 도모했던 집현전 학사들의 충절과 명분은 얼마만큼 정의로운 것인가하는 의문을 금치 못합니다.
전제왕권제(專制王權制)가 조선시대의 효율적인 정치체제라거나 의정부집정제(議政府執政制)가 보다 민주적 합의제라는 논의도 결과적으로 어느 한 쪽에 가담하는 것이란 점에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 저무는 청령포의 화두(話頭)는 한 어린이의 무고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정권쟁탈의 잔혹함입니다. 정(政)은 정(正)이고 권(權)은 균형(均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령포에서 바라보는 정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정권을 바라고 정권은 재부(財富)의 경영과 세습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믿고 싶지 않은 당신의 글을 다시 읽게 됩니다. 금(金)없이 권(權)이 설 수 없고 권(權)없이 금(金)이 재생산될 수 없기 때문에 금권의 축적과 세습 그것은 고금을 통하여 변함없는 정치적 주제라 하였습니다. 민생(民生)과 철학은 그것의 방편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富)의 형태가 토지에서 자본으로 변화된 오늘날에도 그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정치의 목표인 한 이념과 철학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청령포는 유괴되고 살해된 한 어린이의 추억에 젖게 합니다. 무고한 백성의 비극을 읽게 합니다. 역사의 응달에 묻힌 단종비 정순왕후(定順王后)의 여생이 더욱 그런 느낌을 안겨줍니다. 궁중에서 추방당한 그녀는 서울 교외의 초막에서 동냥과 염색업으로 한많은 생애을 마칩니다.
그녀의 통곡이 들려오면 마을 여인들도 함께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동정곡(同情哭)을 하였다고 합니다. 핏빛보다 더 진한 자줏빛 물감을 들이며 가난한 한 포기 민초로 사라져 갑니다. 동정곡을 하던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이나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체를 수습했던 영월 사람들의 마음을 ‘충절’이란 낡은 언어로 명명(命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동정은 글자그대로 그 정(情)이 동일(同一)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설움과 같은 한(恨)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단종을 궁중으로부터 이들의 이웃으로 옮겨오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단종을 정순왕후의 자리로 옮겨오고, 다시 가난한 민초들의 삶속으로 옮겨 오는 일입니다. 단종의 애사(哀史)를 무고한 백성들의 애사로 재조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투적인 역사적 포폄(褒貶)을 통하여 지금도 재생산되고 있는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는 길이며, 구경거리로서의 정치를 청산하고 민중이 객석으로부터 무대로 나아가는 길이며 민(民)과 정(政)이 참된 벗(大友)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신영복 '나무야 나무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