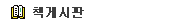주말에 비가 내렸다.
전날 먹은 헤네시가 위장을 소독하듯 세상 곳곳을 소독하고 있다.
낯선 곳에서의 생활도 어언 13년째에 접어 든다.
내가 녀석을 처음 만난 건 13년 전 멋모르고 상경했던 그 즈음이었다.
작은 키에 좌우로 길게 찢어진 눈매 뭐가 그리 불만인지 항상 튀어 나와있던 입술.
녀석을 볼때면 난 항상 기분이 찝찝해져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픈 욕망이 인다.
녀석을 첫 대면한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상경 후 강남터미널에 내려 지하철이란 걸 처음 탔을 때
얼마 들어 있지도 않던 내 지갑을 소매치기 하던 그 놈.
평소 사람들의 스킨쉽이나 터치를 병적으로 싫어했던
내 히프를 이수영의 노래처럼 스치듯 지나치던 그 놈의 손목.
동작그만.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라는 말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표정으로 난 녀석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 악!
녀석이 내게 했던 첫 마디였다.
나는 녀석을 지하철 바닥에 내팽게치고 지갑을 회수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남에 일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고 녀석의 시선은 내 사타구니를 노려보고 있었다.
순간 살기를 느껴 본능적으로 무릎을 오므렸다.
역시나 녀석의 발등이 오므려진 내 두 무릎 사이에 걸렸다.
요것봐라?
나는 녀석의 멱살을 움켜쥐고 다음역에 내렸다.
녀석은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순순히 나를 따라 내렸다.
그게 시작이었다.
녀석은 상경 후 처음 사귄 친구였다.
그후로 녀석과 나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생사를 같이 해왔다.
그리고 석달 전.
아마 그즈음일 것이다.
녀석이 내 여자친구와 바람이 난 시점이.
믿을 수가 없었다.
다른 놈도 아닌 그녀석이라니.
샤워하고픈 마음이 들만큼 찝집하게 생긴 녀석과 바람이 나다니.
도저히 믿을수가 없었고 그 찝찝함에 닭살이 돋았다.
그리고 주말.
닭살을 삭히기 위해 헤네시 한 병을 다 비우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벙거지 모자와 검은 마스크와 검정 뿔테 안경을 구입했다.
홈쇼핑에서 구입한 장미칼을 수건에 감싸 가슴팍에 감춰두고 녀석의 원룸으로 향했다.
비번은 그대로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주냄새와 땀에 찌든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콧속을 쑤셔왔다.
숨이 턱 막혔다.
신발 자국이 날까봐 신발 바닥은 미리 사포로 문질러 두었다.
녀석은 코를 골며 세상모르게 골아 떨어져 있었다.
두번의 들숨과 세번의 날숨이 교차하던 순간 나는 몸을 날렸다.
정확히 배꼽 좌측 5센티 부근에 장미칼이 박혀 들었다.
아니 박혀들었어야 했다.
캉!
느낌이 이상했다.
녀석은 이런적이 많았던지 뱃속에 감추어둔 철판을 꺼내어 무기로 삼았다.
철판은 미리 갈아두었는지 장미칼 만큼이나 예리하게 갈려져 있었다.
- 시발 뭐야!
녀석은 고함을 치며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뒷걸음치며 녀석과 뒹굴며 육탄전을 벌였다.
십 여 분이 지났나. 녀석과 나는 원룸 앞 골목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녀석의 왼쪽 허벅지에는 장미칼이 깊숙히 박혀 있었고
내 아랫배는 예리한 철판에 베여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살짝 창자 같은 무언가가 삐져 나올려고 하는걸 오른손으로 억지로 쑤셔 넣고 있었다.
그때 처음 보았다.
녀석의 웃는 모습을.
녀석은 쓴 웃음을 한번 짓더니 왼쪽 허벅지에 박혀 있던 장미칼을 뽑아 들고
내게 달려 들어 반쯤 붙어 있던 내 아랫배를 사선으로 정확히 그어버렸다.
- 컥!
내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내 뱉은 말이다.
녀석은 아직 숨이 붙어 있던 나를 들쳐매고 자신의 원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나의 아킬레스 건을 자른 뒤 욕조에 기대어 피가 빠지길 기다렸다.
6시간 뒤 피가 다 빠져 어느정도 가벼워진 나를 장미칼로 등분을 내기 시작했다.
과연 광고대로 뼈까지 잘 썰렸다.
녀석은 나를 정확히 154조각으로 포를 떳다.
잠시 밖을 나가더니 20분쯤 지나서 다시 들어왔다.
왼손에는 대형 검은 봉지가 십여장 들려 있었다.
녀석은 나를 그 검은 봉지에 담기 시작했다.
척.척.찹.찹.착.
장미칼의 위력으로 잘게 썰려진 나를 일곱 봉지에 나눠 담은 뒤
빨간 대형 캐리어에 담기 시작했다.
그리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 네. 30대 초반 남성. 살코기 35킬로. 뼈. 8킬로. 금액은?
- 흠. 알겠소. 그렇게 합시다.
잠시 후 녀석은 나를 담은 캐리어를 끌고 어딘가로 향했다.
우리가 사투를 벌였던 그 골목, 우리의 피가 흥건했던 그 곳.
주말에 내린 비는 우리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 내어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도심의 하루를 시작케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