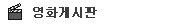어제 극장서 컨택트 봤는데, 앞자리 사람이 허리를 수그리고 - 그러니까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듯이요.- 앉더군요.
그리 앉으니 자막이 그 분 머리에 다 가려지더라고요.
덕분에 영화관람 시원하게 망쳤는데, 더 시원히 망한건 뭐가 문젠지 몰라 화도 못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분 자세와 제 키 중에서요.
그 분 자세 문제라면 극장 매너의 영역일테고
제 키 문제라면 제 다리나 허리 아님 목 중 하날 뽑아 늘려야 겠지요.
이거 어느 쪽이 문제인가요?
*행복의 상수와 변수.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란 상수는 최대한 키우고 변수는 줄이는 것이리라. 만약 그것이 한계에 다다른 듯 보인다면 그 둘을 뒤바꾸는 방법도 시도해볼만 하다. 상수는 변수로 변수는 상수로.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을 내일이라도 사라질 것으로. 찰나에 불과할 것이라 믿었던 것을 다시 눈 뜨더래도 그 찬란함을 잃지 않을 것으로.
*거대한 비극은 삶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했다. 비극 이후 삶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알았다. 거대한 비극이 무너뜨리는 것은 삶의 거대한 일부일 뿐이다. 그 거대함 때문에 당장 눈에 드는 것이 없을 뿐 삶의 다른 부분은 여전히 그리고 온전히 존재한다. 보이지 않아도 수평선 너머 다른 대륙이 존재 하듯.
무너진 거대한 삶의 부분을 재건하던지, 남겨진 작은 삶의 부분을 거대하게 키우던지 좋을대로 하라. 비극은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나는 정말 '남'을 위한 걸까, 아니면 그 남이 받는 상처에 상처 받는 '나'를 위한 걸까.
내 사죄는 정말 나로 인해 상처 받은 누군가를 위함일까? 그 누군가의 상처로 인해 상처 받는 나를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내 사죄로 누군가의 상처가 치유된다면, 그로 인해 내 상처도 치유된다면 내 사죄는 진정한 사죄일까?
*다만 그것이다.
*아무래도 난 네츄럴 본 냥덕인가 보다.
*지옥보다는 지옥이 없다는 것이 더 두렵다.
*훼손 되지 않는 정의도, 정의를 따른다는 착각도...
어째 정의에 관련된 건 다 무섭냐..
*'우리'가 국가를 따를 것인가
국가가 우릴 따라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국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때론 폭력이다.
*상대성 이론은 잔인하다.
웃으며 먹고 놀아도 결코 4월 16일을 잊지는 않는다.
그게 내 최소한이다. 잊는 순간 난 금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