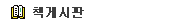눈을 맞으며 그녀가 서 있었다. 허공 위로 뿌옇게 나부끼는 한숨. 추위에 슬며시 몸을 떠는 그녀의 모습을, 나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사람 없는 외로운 길목 위로 서있는 그 모습이 그림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목에 걸어두었던 사진기를 살짝 들어올렸다. 그리 춥지 않으리라 생각해 장갑을 끼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포커스를 맞추려고 애쓰는 내 손은 초조한 마음처럼 부르르 떨고 있었다. 혹시 나도 그녀처럼 하얀 한숨을 흐리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은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전히 흐려진 초점을 바라보며 나는 괜히 카메라에게 내심 짜증을 퍼붓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초조한 나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차분할 따름이었다. 그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게는 알 수 없었다. 약간 치켜든 고개는 먼 허공을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렌즈 너머로 바라보는 그 모습에, 어째선지 안달하는 나의 태도가 바보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 그녀처럼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몸의 떨림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계산도 없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마침내 포커스가 그녀에게 맞춰진 순간 나는 약간의 달성감을 느낄 새도 없이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찰칵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 사이로 울려 퍼지고. 그녀는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보았다. 눈 머금은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사과의 말을 건넸다. 생각도 없이 셔터를 눌러버리고 말았지만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쾌한 행위인지는 잘 알고 있었다.
“뭘 찍으신 건가요?”
그녀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아무래도 방금까지 보던 것을 다시 쳐다보는 듯 했다. 나는 고민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꺼내야하는지가 두 번째 고민이었다.
“당신이에요.”
변명이 서툰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심 화를 내진 않을까 싶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 봤을 때처럼 차분하게 한숨을 나부끼며 말했다.
“그럼 저것도 찍어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을 들어 올려 어딘가를 가리켰다. 나는 그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손가락 끝이 향하는 먼발치, 잎사귀를 벗어던진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는 작은 새둥지가 있었다.
나는 다시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언제부터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녀는 이미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이유를 물어볼 기분이 사라졌다. 나는 말없이 카메라를 들어 올려 둥지를 향했다. 하지만 바로 셔터를 누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내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나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것을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불평 없이 똑같은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녀만큼은 이해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푸드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까치가 나뭇가지 위로 찾아들었다. 너무 먼 탓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벌레를 물고와 새끼들에게 먹여주고 있는 듯 했다. 적막하기만 했던 거리 위로 짹짹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그제서야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천천히 내리며 짧은 한숨을 쉬었다. 평소라면 사진이 잘 찍혔나 확인하고도 남았을 테지만 그것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기묘한 확신을 느꼈다.
“저기, 이 사진 인화해서 드릴까요?”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찍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내가 다시 말을 붙일 새도 주지 않고, 그대로 등을 돌려 떠나갔다.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녀를 붙잡을 어느 말도 떠올리지 못했다. 회색빛의 시멘트로 덮여있던 거리가 새하얗게 눈으로 물들도록 나는 그녀의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어두운 내 자취방의 한 켠에서 조용히 사진 두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장은 그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고, 한 장은 그녀의 부탁을 받아 찍은 새둥지의 사진이었다. 나는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녀는 이 둥지를 한참이 지나도록 바라보고 있었고, 왜 나에게 이 사진을 찍으라 했을까.
이제는 대답 할 수 없는 사진 속의 그녀를 보면서도 나는 끝내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겨울의 둥지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추운 날씨 속에서 이 둥지를 끈질기게 바라보던 이유를 찾을 수는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올려진 그 둥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무언가의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몇 달 뒤, 나는 대학의 졸업 전시회 안에서 몇 명의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에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달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성취감이나 내 사진을 선보인다는 도취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입구에서부터 밀려드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언젠가 봤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는 누군가를. 분명히 그것은 내가 얼마전에 보았던 그녀의 모습과 쏙 빼닮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의 무리에 쓸려 다니며 당황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무수한 사진들이 붙어있는 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몇 장의 사진과 더불어 그녀에게도 익숙할 사진 한 장이 붙어있었다. 벌레를 물고 있는 어미 새와 그것을 받아먹는 아기 새가 찍혀있는 겨울 둥지의 모습. 그리고 그 밑에 나는 조그마한 글귀로 ‘헌신’이라고 적어놓았다.
어쩌면 그녀가 그토록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것은 그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인지 모른다. 추운 겨울 속에서 새끼를 위해 벌레를 물고 찾아드는, 앙상한 나뭇가지 위의 겨울 둥지. 그 어미새의 행동을 누군가가 지켜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표현할 말들은 아주 많았고 다양했을 테지만, 나에게는 '헌신'이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바로 나를 찾아낸 그녀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에.
나는 더 이상 어떠한 해답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