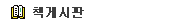<아무도 아닌>은 여덟 개로 인생의 토막들을 담아냈다.
극적인 기승전결도, 엄청나게 독특한 설정도 없는 단편들이지만 이 책은 독자를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
등장인물의 시선으로 생각으로 의식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간다. 서서히 스며들듯 젖어 들게 하는 단편집이다.
<아무도 아닌>을 읽으면서 나는 아팠다. 심장이 저리듯이 아팠다. 특히 <웃는 남자>의 마지막 문단이 그랬다.
‘내가 여기 틀어박혔다는 것을 아는 이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므로 나는 내 발로 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생각해왔다.‘
사별, 혼자 남겨짐, 외로움 같은 감정에서 오는 아픔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질, 변하지 않음,
두려움 같은 것이 날 아프게 했다. 디디 대신 가방을 그러쥔 자신을 원망하며
자기도 모르게 정해진 피륙의 무늬를 직조해내는 패턴의 연속들을 응시하며 한없이 무기력해진 남자...
나 또한 내게 깃든 패턴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떠나보내지 않았던가. 그렇게 외롭고 우울한 낮밤을 보내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겨내려 무던히 애를 쓰지 않았던가.
이 소설집을 읽으면서 나는 오제의 여자친구였고, 호재의 고양이들을 돌보며 서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제희와 제희의 가족들을 떠올리는 이었고, 의자에 앉아 실리를 기다리는 치매걸린 노인이기도 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히스테릭해진 여자이기도 했고, 축축하게 젖은 아들을 엎고 달렸던 남자기도 했으며,
불 꺼진 부엌에서 생곡을 씹는 남자였고, 웃늠. 하고 웃는 여자였다.
모든 주인공이 ‘나’였고 ‘나’일 수 있었다. 황정은의 단편집은 그만큼 흡입력 있다. 인생의 토막을 잘라 맛있게 구워낸 작품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맛보았을 감정들을 잘 녹여낸 작품이다.
그래서 나는 묻고픈 게 생겼다.
이 책을 읽은 여러분은 여덟 개의 작품 중 어떤 것이 가장 아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