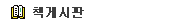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사이로 여과 없이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망스럽던 뜨거움은 어딜 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으로 햇빛이 스며들어 책상 위에 있는 우리 집 고양이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흔히들 치즈태비라고 부르는 우리 집 고양이는 옛 저녁에 고양이로서의 진화는 포기하고 돼지로서의 퇴화를 거듭하고 있다.
보통의 고양이들의 머리부터 허리 꼬리까지 이어지는 날렵한 선, 날카로운 눈매, 언제라도 재빠르게 움직이게 해주는 날렵한 발에 비해
우리 집 돼지는 머리부터 허리 꼬리까지 이어지는 지방, 동글동글한 눈매, 바닥에 들러붙기에 최적화된 발까지 완벽한 삼박자를 갖춘 돼냥이었다.
재빠르게 움직이는 걸 본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고 가끔 움직이는 걸 봐도 마실 나온 어르신들이 그러하듯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며 걸었다.
다만 이 녀석이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청소기 소리가 들릴 때 이다.
청소기를 드르륵 끌며 들어오면 책상 위에서 널브러져 있다가도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본 후 몸을 일으킨다.
위이잉 하고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면 재빠르게 어딘가로 뛰어가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기어나와 책상에 널브러져 있다.
사건은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날따라 유난스레 깔끔 떨어보겠다고 집안의 문이란 문은 다 열고 청소기를 들었다.
오늘은 청소하다가 옛 사진앨범을 발견하든 공책을 발견하든 여의치 않고 끝까지 청소를 끝마치리라 불타는 결심을 한 후 청소를 시작했다.
소파 밑의 거미가 집을 지어도 할 말이 없는 먼지구덩이부터 시작해서 거실, 베란다까지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녔다.
먼지가 가득하게 끼어 있는 방충망은 떼 욕실로 옮기고 욕조에 물을 받아 세제를 조금 푼 후 담아 놓았다.
약 3시간이 지난 후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둘러보았다.
고양이 털 하나 찾아보기 힘든 마루, 새로 사와서 달아놓은 듯한 방충망 등 고된 작업이었지만, 뿌듯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이번 대청소로 소정의 결과물도 얻게 되었다.
사오고 하루가 지나자마자 분실된 고양이 오뎅꼬치, 막대 끝에 기다란 실을 방울에 묶어놓은 장난감, 간식으로 가져온 간식 스틱까지 분명 우리 집 돼지가 숨겨놓은 게 분명했다.
오랜만에 되찾은 장난감을 보자 '이거라면 저 녀석도 신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들떠 장난감을 들고 매번 녀석이 있던 책상으로 갔다.
생각과는 다르게 책상 위는 텅 비어 있었다.
"어디로 간 거야?"
집 이곳저곳을 찾기 시작했지만, 고양이 털 하나 보이지 않았다.
갑작스레 등골이 서늘해졌다.
오늘 대청소를 하느라 방충망을 때어내고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놓았었다. 혹시…. 나간 게 아닐까?
애써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집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아닐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초조함 조급함 불안함이 찾아왔다.
아무리 찾아봐도 집에는 없다. 나갈만한 여건은 충분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비야!!!"
나비라는 이름이 아닌 돼지라고 평소에 불렀지만, 입에서는 저절로 녀석의 이름이 나왔다.
"나비야!!!"
주택가 골목으로 대답 없는 소리만 퍼져나갔다.
담벼락 사이 좁고 어두운 길까지 얼굴을 비집고 넣어 들여다보았다.
없었다.
점점 더 다급해졌다.
"나비야!!!!!!"
이곳저곳 숨 가쁘게 뛰어다녔다. 가끔 인사하던 동네 아주머니를 붙잡고 물었다.
"혹시 고양이 못 보셨어요? 노란 등에 발은 하얗고. 살찐 애요"
"모…. 모르겠구나"
다급한 표정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이것저것 물어보자 아주머니도 짐짓 당황하신듯했다.
다시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 한다.
매번 손을 건내면 머리를 손에 콩 하고 부딪혀 오고 핥아 주던 아이를 이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둥그런 몸을 끌어안고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비비며 전해져오는 따스함을 이제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언제나처럼 의자에 앉아 있으면 곁에 걸어와 "야옹"하고 소리 내며 무릎에 올려달라고 하던 그 순진한 눈망울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헉 헉 헉"
이곳저곳 둘러보았지만 결국 허사였다.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별안간 눈물이 흘렀다.
평소에 돼지라고 놀리지 말걸, 무거워도 그 좋아하는 무릎에 언제까지라도 올려줄걸, 간식 달라고 야옹 하고 우는 걸 콧잔등 때리며 막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여줄걸
아침에 곁에 다가오는 녀석을 바쁘다고 밀어내지 말고 한 번 더 품에 안아 줄걸….
해가 뉘엿뉘엿 산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푸르던 하늘은 붉게 변해갔다.
결국, 나비를 찾지 못했다.
오늘 왜 안 하던 청소를 했을까 했어도 방충망 청소를 하지 않거나 문을 열어놓지 말걸 하고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계속해서 찾아들었다.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지독하게 무거웠다.
집 문을 열고 들어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녀석이 이제 집에 없다는 걸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집안 풍경을 눈에 담았다.
장롱 뒤로 뭔가 탐스러운 게 살랑거리고 있었다.
"...."
벌떡 일어나 장롱에 다가가 살랑거리고 있는 꼬리를 잡고 끌어내었다.
"냐아아아아앙"
한참 편한 자세를 잡고 있는데 왜 건드리냐는 듯 녀석은 눈을 게슴츠레 뜨고 나를 바라봤다.
"허."
"니야아아앙"
꼬리를 계속 잡고 있는 게 불만인듯 계속해서 울었다
"이 망할 캣새끼가"
콧잔등에 강하게 딱밤을 놓아주었다.
---------------------------------------------------------------------------------------------------------------------------------------------------
우리는 아직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