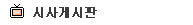최 씨의 투정만 아니었으면,..
'Traffic is heavy at this time'
어제 외운 영어회화 쪼가리를 읊조리며, 맨날 늦다며 왕짜증을 내고 휙 가버린 최 씨 뒤통수에다 대고 (속으로) 온갖 욕을 해대던 김 씨는 그이가 저 멀리 모퉁이 뒤로 사라지자 그제서야 한 평 남짓 주차타워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근무교대 시간 오전 08시,
6시에 새벽 밥 먹고 출발해도 부천서 강남까지의 교통사정은 사십대 바람난 X 거시기마냥 단 한 번도 무사한 날이 없었다.
교통사고, 파스, 정비 불량으로 퍼진 차.... 도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 한 날도 무사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조금 더 일찍 출발? 그건 아니지... 희안한 건, 6시에 출발하면 늘 8시 조금 지나서 도착하더란 게다. 김 씨가 한 번은 10분 일찍 집을 나선 적이 있었다. 웬걸? 30분이나 일찍 주차타워에 도착, 결과적으로 최 씨 보다 30분이나 더 근무를 하게 된 것이다.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다.
오늘 따라 최 씨의 악다구니가 보통이 아니었다. 열에 바친 듯 그이는 쌍욕을 퍼붓고 자리를 떠났다. 그래도 김 씨는 게이치 않았다. 욕 한 번에 이십여 분 정도 시간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면 남고도 남는 장사였다.
그래도 욕 듣고 기분 좋을 리야 있나. 투덜거리며 사무실 청소를 하던 그에게
오피스텔 맨 꼭대기에 사는 개망나니 넘이 만 원 짜리 한 장을 휙 던지고 지난다.
‘그러면 그렇지’
김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개망나니 넘은 근무교대 시간 전, 고주망태가 되어 아가씨를 데리고 왔었다. 그때마다 김 씨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해댔다.
‘도련님 오셨어요?’
도련님은 개뿔, 부동산으로 졸부된 아부지 잘 만나 훼라리를 빨,파,노 세대 씩이나 주차장에 세워 놓고 지 기분 꼴리는 대로 몰고 나가는 개망니넘이 아니던가.
비오는 날에는 울적해서 불루~~~
맑은 날은 옐로우~~
하여간 그런 넘이 이뿐 아가씨를 데리고 올 때마다 김 씨는 도련님이라 부르며 인사를 해댔는데, 이 자식이 그게 좋았던지 늘 다음 날 아침이면 만 원 짜리 한 장 씩 던져 주더라는...
각설하고...
하여간에 한 달에 이십일은 여자 끼고 오는 넘이니 그 수입이 김 씨로서는 너무 짭짤하여 황홀할 지경이었다...
‘막걸리 값 벌었다.’
김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한 평 짜리 사무실로 돌아 와 휴대폰을 켰다. 7층 짜리 복합건물, 오전까지는 늘 한가했다. 그러니 점심시간 전 까지는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다. 김 씨가 (비록 급여는 적지만) 이 시간대를 선택한 것도 오전 시간의 주는 그 한가로움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휴대폰을 켜고 모 싸이트에 접속한 김 씨는, 끓어오르는 희열을 느꼈다. 눈에 가시 같은 넘이 신고누적으로 드디어 차단 된 것이다.
이 넘은 특이한 쉐이였다.
보통은 비공 몇십 개 때리고,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양념으로 쌍욕 몇 개 날리면 제풀에 지쳐 떠나기 마련인데. 이 불한당 같은 쉐이는 그걸 즐기는 지... 욕을 해도 점잖게 댓글을 달고 비아냥거려도 오히려 공손히 대접하는... 하여간에 여태껏 보지 못한 희안한 넘이어서 늘 경계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사단이 난 건 얼마 전이었다.
이노무쉐이가 한 달여를 그리해대니... 아~ 다른 넘들까지 용기를 내 지하고픈 말을 해대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것도 모자라, 아 글씨~~~ 우리도 한 번 용기를 내 봅시다라하니
한꺼번에 4-50명이 나서 ‘허접한 글’에 찬성 질을 해대는 것이었다.
김 씨는 경악했다. 이렇게 많았단 말인가. 말없이 지켜보던 이가...
여기가 어떤 곳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모르는 이는 누가 작업을 하는 지 안다. 천만에... 이심전심이다. 끼리끼리 모이고 보면, 허접한 인생들이 부대끼다 보면, 없는 넘 사정 쭉정이가 더 잘 안다고 희안하게 통하는 게 있었다. 그렇게 ‘척이면 딱’ 골수들만 남아 우리의 세상을 구축한 것이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없다는 걸 잊어라‘
그렇다. 해미가 한 말을 듣고 김 씨는 소름이 돋았었다.
가상의 세계... 판토마임의 세상,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되는 거다. 없다는 걸 잊어야 하는 게다.
그노무쉐이는 이 세계를 파괴하는 넘이었다. 없애고도 남을 넘이었다.
안다. 김 씨는... 본능적으로.... 그넘이 위험 인물인 것을... 나의 세계,,, 내가 구축한 우주를 쌍그리 없애 버릴 넘이란 걸...
그런 놈, 불한당, 재수 없던 그 넘을 이심전심으로 차단해버린 것이었다.
안경 너머 야릇한 미소를 띄며 담배에 불을 붙힌 그는 아내가 싸 준 도시락을 조심스레 펼쳤다. 사랑하는 그녀는 새벽에 집을 나서는 김 씨를 향해 늦은 저녁 도시락을 준비했었다.
지금 이 시간... 김 씨가 첫 끼니를 해결하는 성스러운 시간...
담뱃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게이치 않고 보자기를 펼친 그이가 감탄사를 뱉는다.
아...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다.
내가 좋아 하는 볶은 김치, 또 멸치조림... 그 옆에 계란 옷을 화려하게 입은 소시지 한 점이 떡 하니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던 것이다.
김 씨는 울컥해지는 마음을 추슬러 젓가락으로 하얀 쌀밥 한 무더기를 집어 입으로 가져간다.
그리고선 황급히 분홍빛 소시지를 삼분지 일쯤을 베어 물고 꼭꼭 앂는다. 아껴 먹어야지.
‘황홀하다.’
하얀 쌀밥과 그이의 조합은 씹을수록 감칠 맛이 살아나 애간장을 녹인다.
너무 감격해서일까. 그만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풀려 남은 쏘시지(계란물 입힌)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다. 하필이면 담뱃재 위에...
김 씨는 떨어진 소시지를 두터운 손으로 집어 유심히 살핀다.
묻어도 너무 많이 묻은 담뱃재...
털어 먹을까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그렇다고 삼분지일이나 남은 소시지를 버린단 말인가.
김 씨의 눈가에 물이 고인다. 재수 없는 쉐이 한 넘을 차단시켜버린 희열도 잠시
그이가 쓸쓸히 한마디 내 뱉는다.
“이 넘의 쏘시지야 왜 말을 못해...왜 너는 니 스스로 담배재 하나 털어내지 못하는 거니”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안경테 밑으로 흘러 내린다.